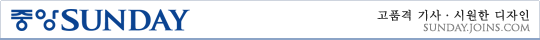기업은 왜 야구단을 갖는가.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기본적 배경은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창구 ▶기업 내부의 결속력 강화 ▶스포츠단을 통한 외부 인지도 상승 ▶이를 통한 매출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메이저리그도 모두 흑자는 아니다)이 아니다. 기존 8개 구단은 연간 2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많아야 50억원 정도를 번다. 그래서 현대 유니콘스가 “야구단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을 때, “내가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그동안 현대를 인수 또는 재창단할 기업을 물색해왔다. 그러나 11일 야구단 창단 의사를 밝혔던 KT가 그 입장을 철회하면서 위신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KBO의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프로야구라는 시장에 대한 가치도 추락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야구가 그 시장, 그 산업에 대한 가치(value)를 상실한 것뿐만이 아니다. ‘프로야구=안정적인 스포츠 콘텐트’라는 이제까지의 인식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KBO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관계자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다.
KT는 통신기업이라는 점에서 스포츠에 대한 그들만의 비전을 갖고 있다. 요즘의 통신기업은 언뜻 떠오르는 이전의 그 ‘전화회사’가 아니다. 그들은 그 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소통의 소재(콘텐트)까지 팔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소재를 외부에서 사다 파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직접 만들고 싶어 한다.
‘콘텐트 산업’이라고 불리는 그 ‘소재’의 시장에 통신기업 KT와 SKT가 뛰어든 건 3~4년 전부터다. KT는 2005년 싸이더스 FNH에 280억원을 투자하며 영화콘텐트 산업에 참여했다. SKT는 YBM서울의 지분 60%를 인수해 음악콘텐트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연예매니지먼트사 IHQ의 지분 34.9%를 확보해 게임개발,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산업의 일원이 됐다(이상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이처럼 KT와 SKT는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콘텐트산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DMB, IPTV, 와이브로 등 방송·통신의 융합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그 콘텐트 확보에 대한 열망은 점점 뜨거워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프로야구단 창단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은 KBO의 미숙한 협상력, 기존 구단들의 배타적 성향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KT 스스로 프로야구를 가치 있는 콘텐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프로야구는 미디어 선호도, 집중도, 연간 볼륨 등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콘텐트다. 3월 말부터 10월까지 벌어지는 경기, 1년 내내 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60여 명의 선수 등은 훌륭한 ‘콘텐트 공장’이다.
그럼에도 KT가 발을 뺀 것은 미숙한 KBO, ‘우리’보다 ‘나’를 앞세우는 기존 구단들과 어울리면서까지 프로야구의 새 식구가 될 만큼 그 콘텐트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우선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KBO와 7개 구단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산업적·시장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프로야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태일 네이버스포츠팀장
![[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