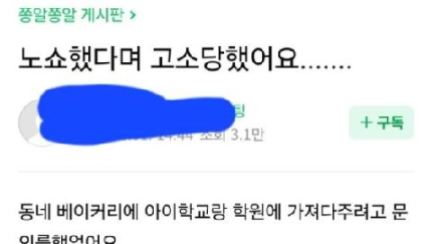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자,「달」과 「어긔야」의 진상이 드러났으니 노래의 핵심은 풀린 셈이군요.축배 한 순배 돌릴까요?』 아리영 아버지가 술잔에 약주를 채우고 모두에게 돌렸다.좌중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특기가 그에겐 있다.
달콤해서 맘놓고 들이키다 보니 좀 취기가 도는 듯했다.흐뭇하면서도 슬프다.이것은 취기와 더불어 언제나 길례를 적시는 느낌이다. 길례에게 술을 가르쳐준 이는 쇠부리꾼 아버지다.
쇠부리를 하기 전엔 대장간 화덕 앞에서 반드시 제사를 지냈다.북어.과일 따위와 함께 약주를 올려 작업의 무사함을 쇠부리 신에게 비는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심부름하던 길례를 불러들여 으레 음복하게 했다.
『옛다,한잔 해라.생률도 하나 먹고….』 『아이 써!』 마다하면서도 술이 늘었다.처음엔 한잔에도 발이 헛디뎌지더니 차츰 끄떡없이 아버지와 대작할 정도가 됐다.시원한 찹쌀 동두주는 감칠 맛이 있어 특히 좋았다.
『요 녀석 보게!』 홀아비인 아버지는 딸과 술잔 주고 받는 것을 진정 신기해하였다.그런 아버지가 연민스러워 길례는 더욱 잔을 퇴할 수 없었다.
취기와 더불어 오는 흐뭇함과 슬픔은 아버지와의 이런 기억과 이어지는 무드인지 모를 일이다.
김사장은 대단히 활기 차 있었다.「음주운전」에 걸린다며 사양하다 끝내는 자기 잔을 아리영에게 권하며 술을 따라 주고는 자기도 한잔 달라고 청했다.
『주시는 잔 딱 한잔만 마시겠습니다.』 하기야 이런 미인을 앞에 두고 안 마실 수는 없을 테지.
『습네다! 어머님은 잘 모실테죠.드리디요.』 아리영이 평양 사투리를 흉내내며 익살부렸다.
『가만 가만!』 서여사가 손을 들었다.
『아리영씨.지금 「습네다,드리디요」 그랬죠?』 『?』 아리영이 굵은 눈을 더욱 크게 뜨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그거야.「됴리」는 「좋으리」야.「다롱디리」는 「자롱지리」고!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정읍사」의 으뜸가는수수께끼 구절 「어긔야 어강 됴리 아으 다롱디리」.
가락에 맞추는,뜻이 없는 소리로 제쳐져온 그 「어강 됴리」와「다롱디리」는「어강 좋으리」「자롱지리」일 것이라는 얘기였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두번째 공부 모임을 갖기로 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여사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리영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