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미국의 시사만화가 아서 모만드가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한 '존스네(The Joneses)'란 만화에 나오는 미국 중산층의 모습이다. 여기서 존스네는 당시 미국 중산층의 소비 행태를 대표하는 가정이다. 실제 만화에는 등장하지 않고, 항상 다른 이웃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기만 하는 미지의 가족이다. 존스네는 이웃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행태를 빗댄 '존스네 따라하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란 말로 급기야 영어사전에 등재됐다.
경제학에선 이를 이웃효과(neighbor effect)라고 한다. 주변의 또래 집단(친구 또는 이웃)의 재산이나 소비수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풍자적 비평가였던 헨리 멘켄은 "부자란 동서(同壻)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말한다"는 말로 이웃효과를 간명하게 표현했다. 절대적인 소득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비교상대인 동서와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더 현실적인 평가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카를 마르크스도 일찍이 "만약 작은 집 옆에 궁전같이 큰 집이 솟아오르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던 그 작은 집은 곧 오두막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이웃효과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사가 찰스 킨들버거의 이웃효과에 대한 언급은 사뭇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한 사람의 복지와 판단에 혼란을 주는 것은 없다." 자기와 능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절절한 상실감을 점잖게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지난해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나타난 계층별 체감소득은 우리 사회의 이웃효과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월소득이 500만원대인 사람 중 26.6%가 자신이 하위계층이라고 답한 반면, 400만원대인 소득계층에선 그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선 61%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평가했고, 36.5%만이 하위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지만 소득순만도 아닌 모양이다.
김종수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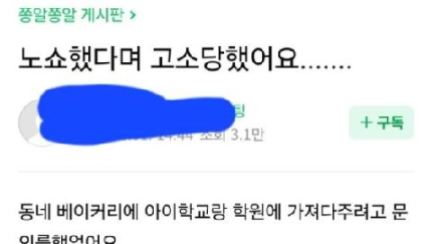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