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좋아하던 과일을 무덤 앞에 놓고 어린 영혼을 위로하는 나의 어머니.
사춘기 소년이었던 형은 어린 동생을 앉혀 놓고 눈을 빛내며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결혼할 때는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이 착한 여자, 얼굴이 예쁜 여자, 가정이 좋은 여자 중 너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여자"라고 대답했다.
그런 형한테 입대 영장이 날아왔다. 9.28 수복 직후였다. 중학교 4학년 이상은 전부 동원 대상이었다. 형은 경기중학교 5학년으로 열일곱 살이었다. 아버지는 사병보다야 낫지 않겠냐며 장교 입대를 권했다. 장교는 열여덟 살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이를 한살 높여 간부후보생으로 입대하게 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 후방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왕 군대를 간다면 전방에 가서 싸워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후방에서 편히 지낸다면 입대할 가치가 있느냐"고 했다. 형도 전방에 가서 싸우겠다고 했다. 당시 아버지의 인맥이나 실정 등으로 봐서 마음만 먹으면 형을 후방으로 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전쟁이 계속되고 부산에서 힘겹게 살던 52년 봄 어느 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형의 전사통지서였다. 그 날 저녁 우리 집은 초상집이었다. 모든 식구들이 목 놓아 울었다. 어린 나는 형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현실인지 꿈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비통한 중에도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음날부터 형이 근무하던 부대서 싸우다 부상당해 부산으로 후송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형은 3사단 18연대 백골부대 소대장으로 중부전선에 투입되었는데 51년 겨울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인해전술 때 강원도 인제지역 전투에서 사망했다. '걸작' 소대장이었으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 나섰을 것이다. 아버지는 전방에 가서 싸우라고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장교로 가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대장이란 전투 현장에서 가장 희생 가능성이 많은 위치다. 형의 전사 후 아버지는 가끔 "나이까지 속이면서 내 자식을 죽였네…"하며 한탄했다.
전쟁이 끝난 1955년, 서울 동작동에 국립묘지가 조성됐다. 가족은 형의 무덤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급조된 묘지는 황량했다. 잔디가 미처 자라지 않아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고 묘비도 돌이 아니라 나무였다. 하얀 묘비에 붓글씨로 '육군중위 김일중의 묘'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형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 바구니 놓고 묘비를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나는 우리 가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했다.
김희중 (상명대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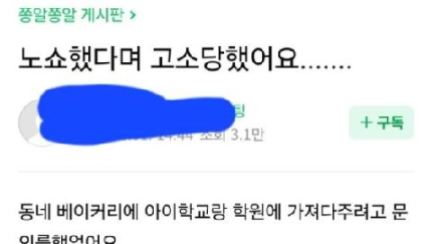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