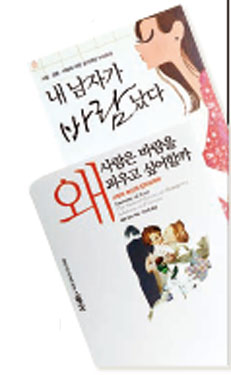
“여편네의 정은 폭포와 같아 왼 골로 쏟아지고, 사내의 정은 들물과 같아 여러 골로 퍼진다.”
우리네 속담이다. 풀이하자면 여성은 오로지 폭포수 떨어지듯 한 사람에게만 정을 쏟지만 남성은 밀물이 빈 웅덩이를 메우듯 이곳저곳 ‘한눈팔기’ 마련이란 뜻이다. 속담의 생명력은 보편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옛사람들이 이에 꽤 공감했던 모양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이 외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하던 논리란 추측이 훨씬 설득력 있긴 하지만 말이다.
김성희 기자의 BOOK KEY
그런데 이것, 과학적 증거도 있다. 적어도 진화심리학자 사이에선 정설이 된 듯하다.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할까』(헬렌 피셔 지음, 최소영 옮김, 21세기북스)를 보자. 진화론과 뇌과학·유전학·인류학 등에 바탕을 두고 남녀의 사랑과 결혼·배신을 분석했는데 이 분야의 고전이랄 수 있는 책이다. 15년 만에 재번역판이 출간될 만큼 대중성도 있다.
책의 요점은 간단하다.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일차적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은 가능한 한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바람을 피우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임신 기간 등 다양한 배우자를 접하기 어려운 신체적 제약 때문에 자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강한 남성을 찾는단다. 요컨대 인간의 바람기는 남녀 모두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거, ‘실전’에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바람 피우다 들킨 남편이 ‘DNA 탓’ 운운하다가는 돌멩이 맞기 십상이다. 당한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원래 그런 족속이라고, 모든 남편이 생래적으로 언젠가는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해도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아내 입장에선 『내 남자가 바람났다』(송강희 지음, 한스미디어)가 훨씬 실용적이다. 특히 일이 벌어진 경우라면 든든한 원군이 되어 줄 책이다. 이런 식이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다.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해?” 공부 좀 했다는 남편이라면 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뻔뻔스럽기는 하다). 일부일처제가 사유재산 제도의 기초이며 나아가 자본주의의 바탕이 됐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터수다.
인터넷에서 여성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 호응이 너무 좋아 아예 책까지 낸, 자칭 ‘불량주부’라는 지은이는 이를 통박한다. 중간고사에서 수학점수 빵점 맞고는 혼내는 엄마에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입시제도 정말 문제 많잖아요?”라고 말하는 아이와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의 게으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한다.
이 책, 남성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하고 불온하다. 아니, 섬뜩하기조차 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혼해 줘”라는 남편에겐 최대한 빌고, 꾸미고, 받들며 참고 살되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았다가 상대 여자가 떨어지면 남편을 찢어 죽이든지, 말려 죽이든지, 가루를 내서 바다에 뿌리든지, 그냥 데리고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권하는 ‘싸움에 관한 스킬2’ 같은 대목이 특히 그렇다. 이처럼 철저하게 아내 편에서 쓰인 책이지만 많은 이가 읽어 둘 만하다. 순애보라 여기고 유부남과 불장난을 벌이는 미혼 여성들에겐 따끔한 죽비가, 혹시 한눈팔 생각이 있는 남편들에겐 ‘외도 백신’이 될 테니.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