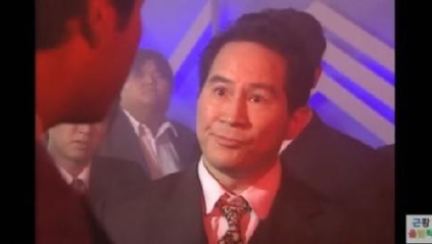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 내 비리 불용(不容)과 정치적 사면 배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제 단행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지난달 말 스스로 했던 정치인 배제 약속을 보름도 안 돼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버린 것이다.
물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정을 일신(一新)해 국력을 모아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면권(赦免權)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을 낳게 된다. 사면이란 원래 왕조 시대의 전통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조치인 사면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일반사면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해왔다. 이번에도 무려 2493명을 특별사면·복권·감형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를 면제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렇게 무더기로 사면을 반복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없다. 수형(受刑)을 하는 자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법을 어겨도 만기(滿期) 전에 풀려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사법기관도 고심을 거듭하며 수사하고, 재판할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선거사범 2375명을 한꺼번에 사면했으니 이러고도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사면은 건국 이후 100번째,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독일은 60년 동안 겨우 네 번의 사면을 단행했고, 프랑스가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하면 남용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역대 정권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사면권을 휘둘러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제도의 오·남용 방지책 강구를 공약으로까지 내걸었고,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인 2004년에는 특별사면도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입법을 추진했었다. 그런데도 자기 정파의 이해가 걸리면 여야 할 것 없이 사면에 매달린다. 사면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좀 더 엄격한 법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