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부모는 스무 살 넘은 성인 자녀의 삶을 어디까지 보살펴야 그 책임을 다한 걸까. 자녀의 어려움에 등 돌리면 부모의 책임을 못 한 게 아닐까. 자녀를 돕는 게 혹시 미래의 나를 위한다는 이기심 때문은 아닐까.
중증 치매를 앓는 노부모 병간호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문득 들 때 자식으로서 죄책감이 밀려든다. 이 감정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성인이 된 자녀와 노부모는 중년의 ‘나’를 두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년은 더 불안하다. 중년의 ‘나’는 이 불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혹시 알고 보니 불안은 결국 ‘나’에게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지현(56·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낸 책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에서 “불안의 삼중고(三重苦)”라는 말로 대한민국 중년의 복잡다단한 심리를 설명했다. 쏟아지는 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자녀들의 취업난 등과 맞물려 중년 부모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 독특한 불안을 맞는다고 했다.
하 교수는 왜 이 시점에, 그것도 중년 세대를 콕 집어서 그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까. 지난달 27일 하 교수를 만났다. ‘불안의 삼중고’에 대처하는 중년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불안을 만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중년들이 이런 불안을 넘어 행복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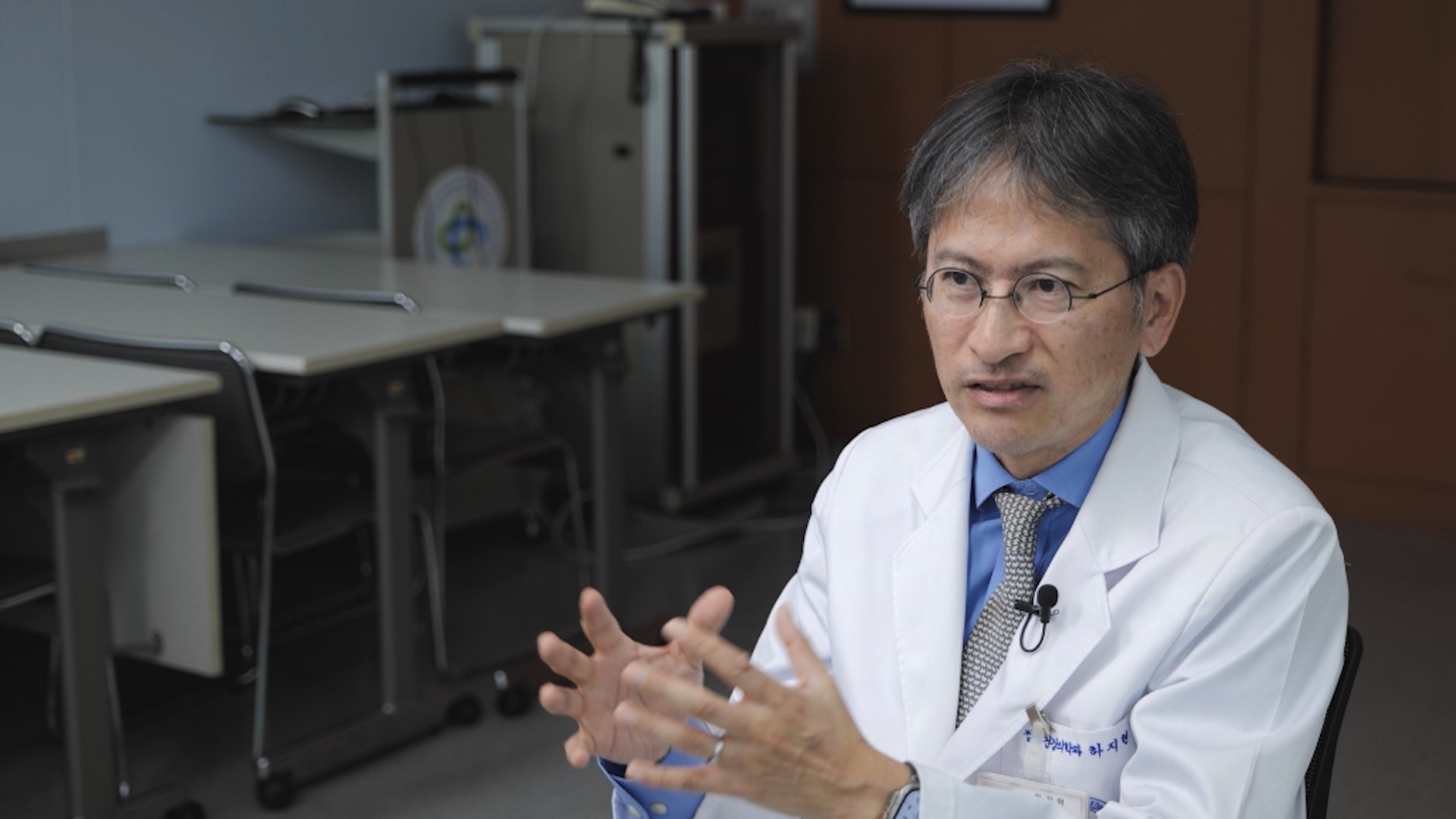
지난달 27일 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정신과 전문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 왜 중년기 정신 건강에 주목했나.
- 중년기라기보다 중장년기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과거 심리학에서 프로이트(Sigmund Freud)나 에릭슨(Erik Homberger Erikson) 등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20, 40, 60대로 구분했다. ‘20살에 청년, 40살이면 중년, 60살이 되면 죽는다’는 걸 전제로 구분했다. 이게 지금은 ‘30대·60대·90대’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60세부터 90세까지 노년기다.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다. 많은 부머들이 노년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독특한 심리적 현상들이 많이 발견돼 중장년기의 불안과 고민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중년을 덮친 세 가지 고통
- 중장년기만의 심리적 특징은.
- 이 시기는 ‘불안의 삼중고’라고 할 수 있다. 나, 내 자식, 내 부모, 세 영역이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불안은 ‘나’의 불안이다. 과거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됐지만 최근엔 빠르면 50대 초반에 직장을 관둔다.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크레바스(crevasse·단절)’를 경험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심리적·정신적 어려움도 함께 찾아온다. ‘남아 있는 시간이 아직 많다’고 느끼면서도 반대로 친구의 본인상(本人喪) 등을 경험하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젊었을 때처럼 뚝심과 의지로 밀고 나가거나 에너지를 낼 시기가 아니란 걸 알게 된다.
두 번째 불안은 ‘자식’이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손이 안 갈 거라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녀 세대는 치열한 경쟁을 경험한다. 과거보다 취업과 독립이 어려워져 30살 가까이 부모에게 의존한다. 부모는 ‘자유로워졌다’는 마음을 갖기 어렵게 됐다. 경우에 따라선 자녀가 결혼하고 취업해도 여전히 손이 간다.
세 번째 불안은 ‘내 부모’의 영역이다. 과거와 달리 평균 연령이 올라가며 노부모가 85~90세까지 살아 계신다. 내가 돌봄 받고 의지했던 부모를 내가 돌보고, 병간호하고, 챙겨야 한다는 불안이 밀려온다. 이런 세 가지 불안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며 ‘나 하나만 잘하면 돼’라는 생각은 소용이 없어진다. 내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독립하지 않은 것, 부모가 노쇠해지며 이런 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심지어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 마음이 한편으론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삼중고’가 중장년기 불안을 키운다.
![[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ac8138be-929f-4f41-8283-4cdfa711b01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