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곳곳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인다는 소식이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내년도 공연 예정 작품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56.4%가 10년 전 외환위기에 비해 요즘이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의 힘’이 유력한 수단이라고 본다. 저소득·소외 계층과 경제위기 속에 새롭게 발생할 신(新)빈곤층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화예술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경제위기 속에 가속화될 수 있는 ‘문화 양극화 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대공황기에 시행했던 문화분야 뉴딜 정책은 좋은 참고가 된다. 당시 미 재무부는 연방미술프로젝트(FAP)·연방음악프로젝트(FMP) 등을 통해 예술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쳤다. 농업안정청은 사진작가· 미술가 등 총 1만 명을 고용해 미국 전역의 공황 사태를 기록했고, 수많은 회화·조각·벽화 작품을 탄생시켰다. 정부 지원으로 저렴해진 관람료 덕분에 대공황 당시 전체 미국인의 65%가 주 1회 이상 영화를 감상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명작들이 이때 나온 것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취지에서 벌여 온 사업들이 있기는 하다. ‘저소득층·소외계층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전국 문예회관 공연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경제난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기존 사업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 뉴딜 정책은 예술가들의 소득보전·복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입에 별다른 사회보장 혜택도 없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대부분의 한국 예술가들이다. 이들의 예술적 재능과 일반 국민의 희망찾기가 연결되는 ‘윈윈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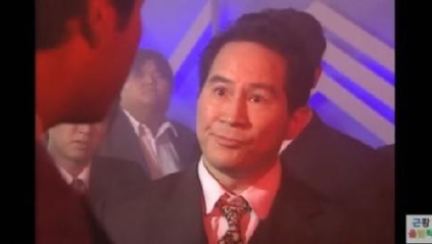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