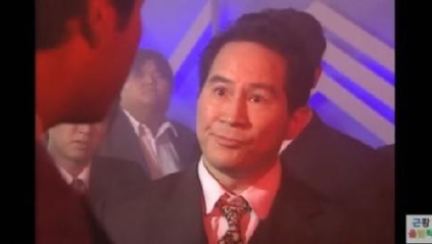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충격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학계·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이번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마지막 집세까지 남긴 세 모녀의 선한 모습 앞에 사람들은 깊은 비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다. 세 모녀는 왜 복지제도에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밑바닥에는 우리 사회에 이미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망이 촘촘하게 짜져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빈곤층이 제도를 몰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벌어진 비극일까.
현장의 복지 전문가들은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신청을 했더라도 십중팔구는 거절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녀 가정은 60대의 어머니와 30대의 두 딸로 구성돼 있었다. 딸들은 카드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 큰딸은 심한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었다. 제도는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다. 가진 것이라고는 월세보증금 500만원밖에 없어서 재산기준은 총족한다.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아니 있어 보이는 가구원이 있으면 일단 외면한다. 딸들은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한 달에 60만원 이상을 벌 것이라는 ‘추정소득’ 대상자였다.
모녀가 질환자임을 호소할 수는 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심사대상은 될 것이다. 식당에 나가던 어머니는 팔을 다쳐 한 달 간 수입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제도는 병원 치료 내역과 함께 최소 한두 달간 소득이 없었다는 기록을 요구할 것이다. 큰딸을 만성질환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년간 통원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큰딸은 꼬박꼬박 병원에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으로 추천받는 길이 있지만 당분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세 모녀는 38만원이던 월세가 50만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어머니의 수입이 끊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처지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가 있다. 이 제도 역시 세 모녀의 위기탈출을 도와주기 어렵다. 어머니의 소득이 끊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딸은 서류상 ‘근로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상을 당해 실업상태에 빠진 근로자를 돕기 위한 고용·산재보험 급여제도가 있다. 어머니는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길에 넘어져 다쳤다. 작업장이 아닌,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되기 힘들다.
정부는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수급자 발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전달·홍보 체계를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과 긴급 의료·복지기준 등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확 손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 모녀 같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만은 정말 촘촘한 복지망을 짜야 한다.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