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이 아무리 개방된다 해도 우리 입맛에 맞는 쌀만 만들어 낸다면 수입쌀이 뿌리 내리지 못할 겁니다."
제25회 청백봉사상 대상을 받은 경남도농업기술원 작물과 홍광표(洪光杓.41)연구사는 남는 쌀과 쌀시장 개방문제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만만하다.
경상대 대학원 농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말 연구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줄곧 쌀만 연구해 온 '쌀박사'다.
洪씨는 거의 매일 오전 8시에 출근, 주로 실험용 논에 나가 온종일 벼의 생육상태 등을 조사한다. 그러고는 저녁에 연구실로 돌아와 실험하다 밤 10시나 돼서야 퇴근하곤 했다.
그가 지금까지 주력해온 연구 주제는 노동력 절감을 통한 쌀 증산. 따라서 요즘 남는 쌀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금까지 집중해온 쌀 증산에 관한 연구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94년 볍씨 파종 뒤 부직포(不織布)를 덮어 20~25일 만에 어린 모를 생산하는 육묘 기술을 처음 개발, 전국에 보급시킨 주인공.
이 육묘법은 그동안 못자리에 비닐과 차광막을 덮었다가 온도에 따라 걷는 귀찮은 방법으로 모를 키워내던 종전의 육묘법에 비해 노동력은 28%, 자재비는 48%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농법. 이 농법은 지난해 말 특허 출원돼 이미 경남도 논 98%에 보급돼 있는 등 국내 표준 재배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洪씨는 또 모를 모판에 기르지 않는 수경(水耕)재배법을 개발, 경남도에서만 연간 모판 흙(床土)값 1백58억원을 절감케 했고, 논을 갈지 않고 볍씨를 뿌려 노동력 88%를 절감하는 무경운(無耕耘)재배법도 보급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 때문에 경남도 내 3백평당 쌀 생산량은 92년 4백23㎏에서 지난해에는 5백1㎏으로 18.4% 늘어났다.
94년 경상대 대학원에서 '쌀 무경운 재배법'이란 논문으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선진국 중 주식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이 바로 현재 아무리 쌀이 남아도 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1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집 한칸 없이 관사(19평)에서 부모를 모시고 부인과 두 자녀 등 대가족(?)이 생활할 정도지만 洪씨의 머리 속엔 오늘도 그저 '쌀'만 그득할 뿐이다.
진주=김상진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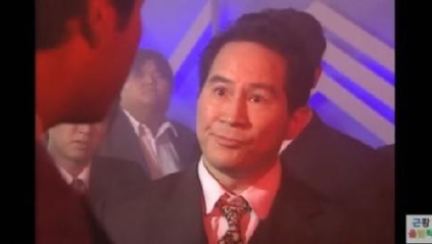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