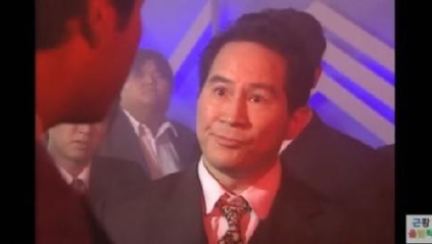한나라당이 다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들고 나왔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9단계인 내신 상대평가를 5단계의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7가지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수능과목을 줄이는 것도 들어 있다.
여의도연구소와 정두언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7대 긴급 대책’은 낯설지 않다.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제시했던 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안은 지난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거부됐다. 당정회의 뒤 교과부는 내신 조정과 학원 심야교습 제한 내용을 뺀 사교육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훼손되면서까지 ‘곽승준→정두언 안’이 힘을 얻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지지부진하다고 안병만 교육과학부 장관을 비판했다.
곽승준→정두언 안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기도 하다. 곽 위원장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교과부는 내심 편치 않은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떨떠름한 듯하다. 교과부 한 관계자가 “무리수를 두다가는 사교육도 못 잡고 공교육만 망가진다”고 한 것도 이런 점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과부는 정치권 탓만 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가 관료주의에 젖어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의 실세들이 줄줄이 교육정책을 파고드는 건 그만큼 교육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드는 민감하고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공동체의 성장동력과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교육분야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에서 혁명 없이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혁명을 대치하는 인프라인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이처럼 여야, 좌우를 넘어서 한국 공동체의 공동목표라는 관점에서 스케일 있게 접근해 줘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의 눈에 교과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교육에 대한 기대는 큰데, 교과부의 접근법이 너무 기능적이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 의원이 “교육개혁을 하기 싫다면 장관이 떠나는 게 맞다”고 말할 정도로 교과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불신은 크다.
안병만 장관은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더라도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안 장관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을 다시 협의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정책을 펴든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