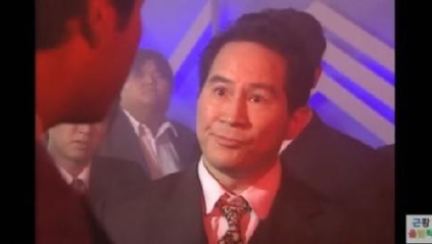부동산 투기 수법 가운데 속칭 ‘알박기’라는 게 있다. 개발예정 지역의 핵심적인 지점에 땅을 조금 사놓은 뒤 팔지 않겠다고 버텨 개발업자로부터 시세의 몇 배, 심하게는 수십 배의 값을 쳐서 받는 수법이다. 사업 추진에 한시가 급한 개발업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알박기 투기꾼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알박기는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만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세에 맞춰 땅을 판 선의의 소유주들에겐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고, 불의가 더 많은 이득을 본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 알박기로 떼돈을 번 사례를 목격한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개발 소문만 들려도 너도나도 안 팔고 버티기에 나선다. 땅값은 터무니없이 치솟는다. 땅값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개발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은 어느덧 없던 일이 되고, 땅 주인들은 그제야 후회해 보지만 대박 기회는 이미 허망하게 사라지고 난 뒤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선 소수 야당이 12일간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다수 여당이 제기한 모든 법안을 상정조차 시키지 않겠다며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무작정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다.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이다. 국회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의석 수에 비례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소수 야당은 의사당의 핵심적인 요지를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의석 수 이상의 힘을 발휘하려 했다. 알박기로 시세 이상의 값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한시가 급한 정부와 여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야당을 어르고 달래봤지만 한번 여당의 약세를 본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쟁점 법안의 일부를 뒤로 미루고 핵심적인 법안만이라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했지만 야당은 이를 무시했다. 야당의 알박기에 거대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녔다. 결국 국회의장은 1월 중에는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드디어 소수 야당은 해를 넘긴 ‘알박기 투쟁’의 승리를 외치며 점거 농성을 풀고 유유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과연 야당의 알박기는 성공한 것인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부동산 알박기가 대박을 터뜨리려면 개발업자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을 쳐서 땅을 사줘야 한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하면서 농성을 풀고 떠난 야당의 손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들이 얻은 것이라곤 여당의 법안 상정을 무산시킨 것뿐이다. 철거반원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처절한 철거민의 모습을 연출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험악한 인상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대박은커녕 쪽박만 차고 만 꼴이다. 여당이 앞으로 법안 상정을 포기하리란 보장을 얻지도 못했다. 부동산 투기로 치자면 겨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데 불과하다.
사실 야당은 알박기로 대박을 터뜨리려 해도 비싼 값을 받고 팔 물건이 없다. 기껏해야 다수당의 입법을 방해하는 것뿐이다. 다수결이란 당연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 거리의 불량배들이 노점상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푼돈을 뜯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야당의 계산 착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한번 야당의 알박기 수법에 호되게 당한 여당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수법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박기 정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문제는 알박기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점이다. 이번 알박기 정치의 대상은 경제 살리기 입법이다. 개발업자는 알박기가 과도하면 개발사업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알박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란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정부와 여당도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들이 먼저 죽어난다.
김종수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