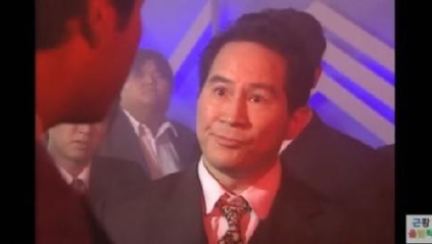송 장관의 이 발언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과 차이가 난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제안하나'라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평화협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종전 선언이 한반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송 장관은 "종전 선언을 지향해야 하지만 휴전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순식간에 가지 않는다"라며 "갑자기 종전 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어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주한미군 문제는 종전 선언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종전 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희석될 뿐 아니라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한 작전 계획의 수정 또는 폐기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 장관이 갑자기 종전 선언을 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한 근거이기도 하다.
국책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은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이 폐기되려면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종전 선언의 위험성은 월남과 월맹 사이에 맺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 여실히 보여 준다. 평화협정 체결 뒤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월맹은 협정 체결 3개월 뒤부터 대규모 공세에 나서 월남은 75년 공산화됐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종전을 선언하는 선언적 평화보다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 전쟁 위협이 없을 때 종전을 선언하는 실질적 평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차례 선언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평화가 구축되지 않아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한 사이에도 선언적인 종전 선언은 남한의 안보 능력을 약화시켜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정용환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