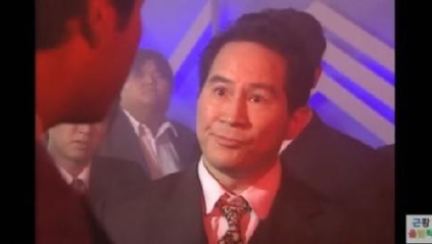새로 개발돼 시판에 들어간 진통제가 서양인에게는 별 부작용이없으나 일부 한국인에게만 특이하게 위장출혈이나 쇼크가 나타날수있다면 그 사실은 언제쯤 파악될까.이에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은 88년이후 부작용 모니터링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약국 3천3곳에서 자진신고를 해야 비로소 파악할수 있게 돼있는데 신고건수가 연간 5~55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시판중인 약에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사용시 주의」「사용금지」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대부분해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형편을 개선하고 선진적인 약물 부작용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진료비 청구용으로 의료보험단체로 보내는 진료명세서자료를 활용,새로운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조사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大의대 朴柄柱교수(예방의학)는 최근 발표한「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약물부작용 모니터링제도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이같이 제안하고 약물처방의 결과를 추적조사할 의약정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國등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사후 추적조사해 효과적인 약물사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특히 지난 70~80년대 10년간의 검증을 통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평가돼 허 가된 일부 신약들이 시판후 신경.콩팥이상,심지어 암까지 일으킬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후 사후추적은 필수사항이 돼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에이즈 치료약등 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의검증후 바로 시판을 허가하는 대신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부작용을사후조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적조사 노하우확보는 신약개발능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하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한번도시판약물에 대해 처방내용과 환자상태를 추적조사한 적이 없어 신약개발시 요구되는 조사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데다 부작용 파악도 늦어 국민들의 약화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蔡仁澤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