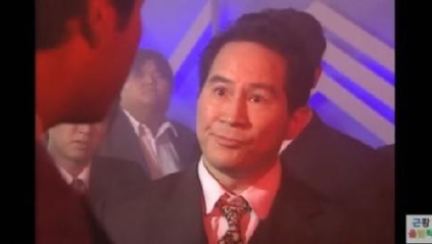조선시대 관리 임명장인 ‘교지’와 요즘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패’. 세종은 지방수령의 임기를 늘리면서 관료들의 저항을 공익 대 사익의 관점으로 풀어나갔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종은 문화(한글 창제)와 과학(농업 및 측량기구) 쪽의 업적으로 주로 알려졌다. 현실정치가로서의 면모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치가 세종'의 면모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지방수령 6년 임기제', 즉 수령육기제(守令六期制)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이다.
수령이라는 지위는 군주의 뜻을 백성에게 펴고, 백성의 생각은 위로 전달하는 '관절'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그런데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수령의 임기는 3년이었다. 세종은 그게 너무 짧다고 보았다. 지역 사정을 알 만하면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선 지방 아전들에게 휘둘리다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보지 못한다.
지방 수령 임기 6년제는 세종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추진됐다. 문제는 관료들의 이해였다. 당시 서울과 지방 간에는 현격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지방은 단순히 서울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야만의 땅'이었다. 양반은 서울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3년이면 잠시 다녀오는 기분이지만, 6년이면 '촌놈'이 되고 마는 형국이었다. 또 하나는 승진 문제. 지방에 있다 보면 승진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고과에 흠이 잡히면 평생을 지방직을 전전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저항은 지속적이고 집요했다. 관료들의 6년 임기제 비판은 첫째, 유교경전에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든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경전의 의의는 마치 오늘날의 '헌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문제 제기였다. 둘째, 중국의 역사와 선왕의 사례(태조.태종)에도 걸맞지 않다는 점이다. 왕조 국가에서 '전통'은 경전과 더불어 정책의 정당성을 버티는 핵심적 사안이므로 이 역시 근본적 비판이었다. 셋째, 관료 자신들의 입장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방에 오래 있으면 승진 기회가 서울에 있을 때에 비해 줄어든다는 것이다. 넷째, 6년은 긴 기간이어서 처음에는 큰 뜻을 품은 수령도 나태해져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당시 수령들의 자질로는 도리어 악정의 기간을 6년으로 더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든다.
이에 대해 세종은 첫째, 6년 임기제가 수령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정책임을 환기시킨다. 둘째, 수령이 자주 바뀜에 따른 영송(迎送:환영 및 환송식)의 폐단이 크다는 점을 예로 든다. 셋째, 경전에는 수령 임기 9년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세종은 관료의 반대가 사적인 이해관계와 불편을 의식한 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즉, 이 문제를 '공익 대 사익'의 차원으로 몰아간 것이다.
'공익 대 사익'의 대결구도는 맹자로부터 연면한 경학적 테마다. 세종은 이 구도를 형성하고 또 장악했다. 이후 6년 임기제를 비판한 관료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모리배로 몰리게 된다. 이를 계기로 6년 임기제는 완전히 제도화되고, 조선 후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된다.
여기서 보이는 세종의 리더십은 '텍스트(經史)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해석 능력'에서 비롯된다. 세종은 유교경전과 역사서에 대한 깊은 독서(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당시 조선의 정황에 걸맞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냄으로써 구체적 전략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경전과 역사서 그 자체를 진리의 현현(顯現)으로 절대화하지 않았다.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도구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는 말이다. 스스로 딛고 서 있는 현실세계를 중심에 놓고, 과거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미래를 과제로 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 자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정치가로서 세종의 시공간 감각이라고 판단된다.
배병삼 영산대 교수.세종국가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