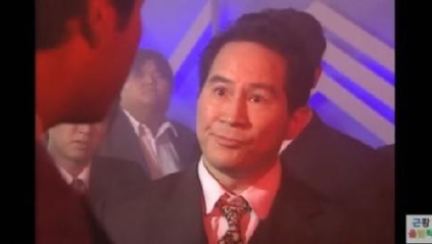요즘 신문지상에 눈을 돌려보면 새 시대에 걸맞은 참신한 의욕과 아이디어들이 포효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지난날의 곪았던 종기들을 터뜨리고 환부를 도려내는 비명, 새로운 살이 돋아나면서 울리는 환호성 같은 것이 한데 어울려 마치 합주라도 하고있는 것 같다.
며칠 전 신문지상에 공표된 학생취업에 대한「교수추천 제」만해도 그렇다. 교권을 확립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 대학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성품이 존중되지 못하는 획일주의와 알맹이가 차지 않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이 지닌 다양한 자질을 한낱 객관적인 시험지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방향에서 발상 된 교수추천제의 취지에 대해 누군들 이의를 제기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기우(?)를 떨쳐버릴 수 없음은 나만의 소심한 탓으로 들릴 수 있을까.
진학이나 장학금을 타기 의한 추천이라거나 서독처럼 전공분야의「보증서」격인 교수들의 권위와 직결되는「전문평가서」를 요구한다면 그런 대로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또 소수정예주의에 알맞게 지도학생과 침식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영국적인 교육제도 아래서 라면 우리도 기대를 걸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전공이 아닌, 학생의 품성이나 인격 또는 행적 등 전반에 걸친 일반추천을 교수한테 요구하는데는 좀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 같다.
예부터 정실·정감주의 일변도로 길들여진 우리들의 생리로서는 그 객관적인 판단이나 평가의 기준도 문제거니와 만인이 언제라도 들춰볼 수 있는「생활기록카드」식의 명세서로 과연 학생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다.
따라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나가려면 우선 추천서의 비밀보장이라는「익명성」 과 추천서의 절대적 권위라는「실질성」이 전제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장치가 있다한들 그 제도의 수행자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운용을 할 때 생기는 허와 부를 우리는 누차, 과거의 체험에서 배워 알고 있다. 수도가 험난하고 궁색해졌음은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에 올리는 말이다. 그런다고 외쳐대서 될 일인가.
떳떳하게 살수 있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자율의 사도상은 응당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그런 처우가 보장될 때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고 뭇사람들이 이미 입을 모아 설파한바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사도의 권위가 여러 의미로 떨어진지 오래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는 이제 옛말처럼 돼버린 현실에서 어찌 그 열매만 여물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사도의 권위와 평가의 권위는 같은 차원에 공존할 수 있으되 평가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를 부추기려든다면 어쩐지 어색하리라는 느낌이다.
허창운
▲1940년 부산출생 ▲1963년 서울대문리대독문학과졸업, 서독뮌헨대 석사·박사 ▲현 서울대인문대 부교수 ▲저서『중세 독일시』『바로크 독일시』



![[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