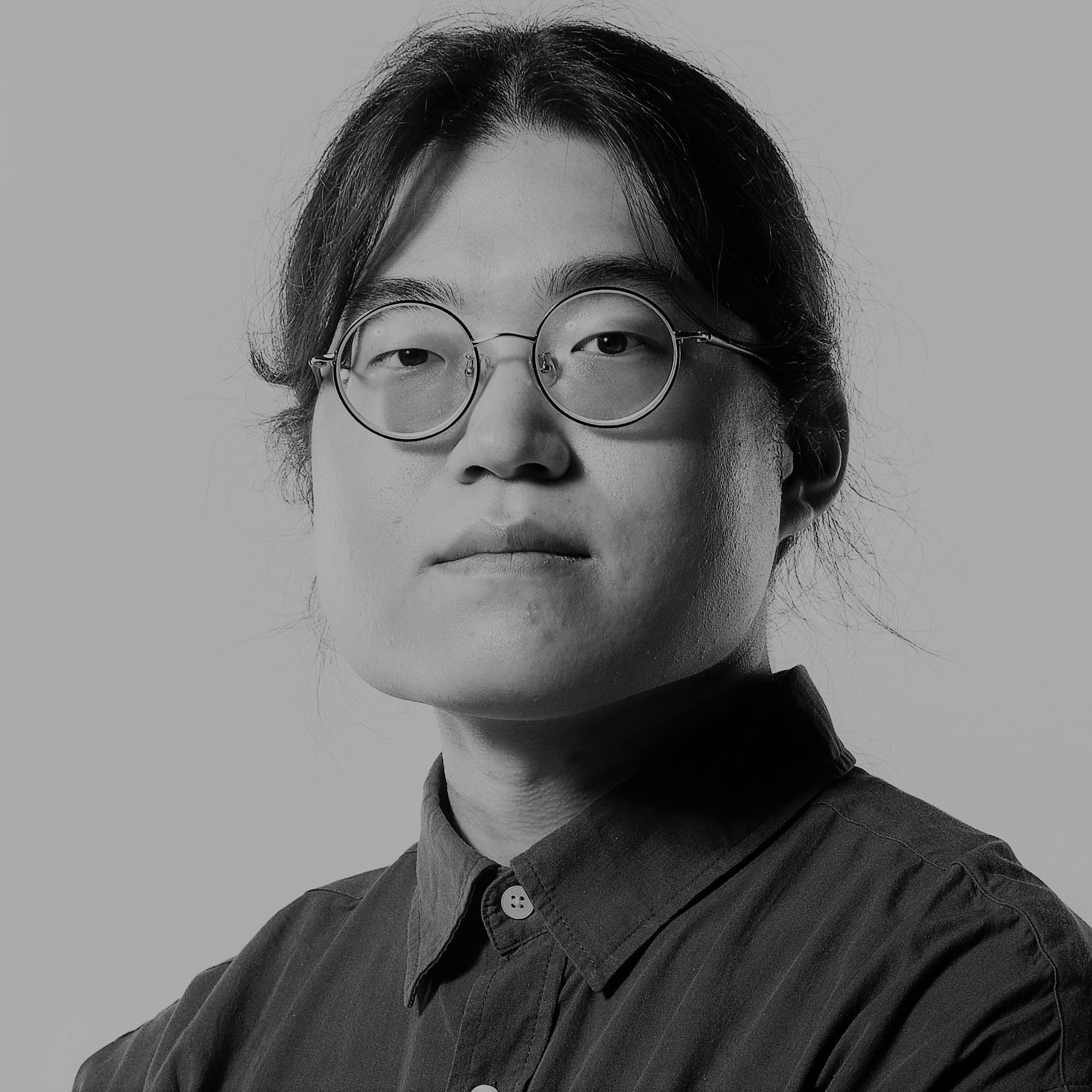
애도할 권리와 애도 받을 권리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 (사)나눔과나눔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 응원
- 17
- 구독
- -
출처
지면서도 주먹 뻗던 투혼…복싱 챔피언, 왜 무연고 사망자 됐나 [김민석의 살아내다]2022.12.01 00:01
총 5개
-
!["누가 오나요?"는 오해...무연고 사망 장례식, 붐비는 이유 [김민석의 살아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29/d19c516b-190c-4323-8a9c-77ed7cbbd130.jpg/_ir_410x230_/)
"누가 오나요?"는 오해...무연고 사망 장례식, 붐비는 이유 [김민석의 살아내다]
고인의 이름 앞에 ‘무연고 사망자’라는 수식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삶이 외롭고 쓸쓸했다고 오해한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그렇게 고인들을 오해했을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봤자 누가 오는데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몇달 안치실에 방치해놓고, 병원은 수백만원 청구서 내밀었다 [김민석의 살아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15/31529ef2-c1ff-4fe6-860b-b295f69d8cc2.jpg/_ir_410x230_/)
몇달 안치실에 방치해놓고, 병원은 수백만원 청구서 내밀었다 [김민석의 살아내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변사자는 경찰이 수사부터 먼저 해야 하고, 설령 병원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연고자 파악과 시신 인수 의사를 묻기까지 어쩔 수 없는 행정 소요가 발생하는 탓에 훨씬 길어진다. 병원에서 숨을 거둔 고인은 그대로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었다. 보통의 절차대로라면 병원과 장례식장이 고인의 연고자 파악과 시신인계를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야 했다.
-
![지면서도 주먹 뻗던 투혼…복싱 챔피언, 왜 무연고 사망자 됐나 [김민석의 살아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01/bfac8b90-2d3e-4e25-ba8c-706b499ddb75.jpg/_ir_410x230_/)
지면서도 주먹 뻗던 투혼…복싱 챔피언, 왜 무연고 사망자 됐나 [김민석의 살아내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특징 중 하나는 영정 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러주는 '나눔과나눔'은 고인의 연고자에게 부고를 알릴 때 적극적으로 영정에 쓸 사진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아~ 그 김O동이 이 분이에요? 저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인의 친구들과 연배가 비슷한 장례지도사는 고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고, 고인을 아는 사람이라는 반가움 때문인지 친구들은 장례지도사와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
!['특관'에 감춰진 삶의 진실...어린이병원서 숨진 그는 중년이었다 [김민석의 살아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20/460da8bf-ec91-40bc-ba46-3177366d1c34.jpg/_ir_410x230_/)
'특관'에 감춰진 삶의 진실...어린이병원서 숨진 그는 중년이었다 [김민석의 살아내다]
다른 장례의뢰 공문과 이 어린이 병원에서 온 공문의 결정적 차이는 나이와 장소였다. 사진을 보고 나니 중년의 고인이 어째서 어린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고인의 가족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린이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이들도 무연고사망자로 장례의뢰가 온다.
-

軍병력 4년 새 11만명 줄어도…대선만 되면 "복무기간 단축"
저출산 위기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난 20년간 국방부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조치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으로 최소 병력 40만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병력 감소 문제를 반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