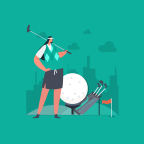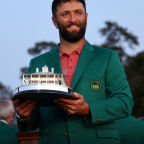K패션, 패션 한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요즘 웬만한 패션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표현이다. 가요·드라마처럼 우리 옷도 세계에서 대접받을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실제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선 디자이너들의 외국 진출을 밀어주고, 브랜드들은 신진 디자이너 지원에 나선다. 불과 2~3년 새 벌어지는 변화다.
글로벌 패션브랜드 디자이너 우영미가 말하는 패션 한류
그런데 10여 년 전 누군가는 같은 꿈을 꾸며 고요하게 움직였다. 바로 디자이너 우영미(53)다. 88년 남성복 ‘솔리드 옴므’를 론칭하고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던 그는 98년부터 해외 시장을 넘봤다. 일단 파리 전시회에 3~4년 출전하며 ‘간’을 좀 보다가 2002년 ‘wooyoungmi’란 브랜드로 파리 컬렉션 무대에 섰다. 여느 디자이너들처럼 요란하게 치르고 다시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올해 3월까지 10년, 20번의 컬렉션을 이어갔다. 가마솥에 물 끓이듯 현지 관계자들의 호평을 지긋이 기다렸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인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파리의상조합’의 회원이 됐고, 브랜드는 말 그대로 ‘글로벌’해지고 있다. 이미 파리·홍콩·런던·도쿄에 론칭한 것은 물론 지난달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에 ‘발렌시아가’ ‘마르니’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 등과 나란히 입점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0년. 그는 열정의 세월을 기념하며 자축 행사를 열었다.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서울 신사동 ‘맨 메이드 우영미’ 매장에서 파리 컬렉션에 나왔던 20개 작품을 전시 중이다. 해외 컬렉션 10년을 겪어낸 그가 생각하는 ‘패션 한류’의 길은 무엇일까.

내 컬러가 뭔지, 내 자리가 어딘지 늘 고민
전시회에 나오는 스무 벌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흘러간 40대의 흔적이자 고통의 산물이었고, 우영미가 누구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패션쇼가 끝나자마자 다음 쇼를 준비하다 보니 1년 달력이 쇼 두 번으로 끝나요. 그렇게 10년이 갔고, 40대가 흘러갔죠. 6개월에 한 번 새로운 것을 쏟아내야 한다는 고통에 휩싸이다 보면 내 인생이 컬렉션만 하다 끝나겠구나 싶기도 해요.”
-시작을 안 했다면 국내에서 돈 좀 벌었을 텐데요.
“돈을 벌어야 하지만 애초 목표 자체가 패션 CEO가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였어요. 뭔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죠. 한국에만 있었다면 지금보다 사업이 다섯 배는 더 커졌을 거예요. 아동복·숙녀복· 속옷 등을 다 하면서. 그걸 안 택했죠.”

-당시 컬렉션에 나간 계기는.
“브랜드 론칭하고 해외 전시회를 구경 다니다 보니 막연하게 되겠다는 감이 왔죠. 그래서 한 번 전시회를 나가봤는데 진짜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3년쯤 전시회만 나갔는데 어느 날 영국 바이어가 그러더라고요. ‘컬렉션을 하면 훨씬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고. 그제서야 용기를 냈죠.”
-해보니 어떻던가요.
“컬렉션의 의미부터가 우리와 달랐어요. ‘아, 컬렉션이라는 게 이래서 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죠. 저도 그 전에 ‘뉴웨이브 인 서울’이라고 지금의 서울컬렉션의 시초가 되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냥 ‘새로운 것을 보여주자’는 거였죠. ‘누구를 위해서’가 없었어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쇼였어요. 파리에 가서 보니 바잉을 위한 컬렉션 자체가 완전히 전문화됐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했죠.”
-가장 생소하거나 어려웠던 점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쇼를 대행하는 회사가 무대 설치, 모델 캐스팅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긴 다 점조직이죠. 모델을 어떻게 캐스팅할지도 몰라 에이전시도 없이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수많은 디자이너 중 내 컬러가 뭔지, 내 자리가 뭔지를 알아내야 하니까요.”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울)서도 팔았고, 거기서도 팔았죠. ‘우영미’로 컬렉션을 하면서도 국내에선 커머셜 라인인 ‘솔리드 옴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갔죠.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해외에서 컬렉션을 계속하려면 자기 베이스 캠프가 확실해야 한다고. 그래야 돈도 벌고 생산 시스템도 갖춰놓을 수 있으니까요. 옷을 팔아 다시 컬렉션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한두 번 실패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신진 디자이너들이 베이스 없이 해외 진출을 하면 그래서 힘들죠.”
파리의상조합 정회원 된 첫 한국인
‘한국에서 온, 남성복 하는 여자 디자이너’. 파리 입성 초기 ‘우영미’를 묘사하는 말은 대개 이랬다. 처음엔 그 말이 싫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국적과 성별로 규정되는 게 꺼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수식어들을 반갑게 받아들인다. 한국의 미가 무의식적으로 깔린 자신의 디자인에 호평을 받고 있어서다. “섬세하고 정리된 디자인이 굉장히 우아하다고 하죠. 서양에서 남자는 굉장히 섹시하거나 아주 마초거나, 아니면 게이로 표현되는 게 다반사인데 제 옷은 지적이고 섬세한 남자를 만드니까요. 제 옷의 정리된 느낌을 보고 누군가는 유교적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 패션에 대해 백지 상태이던 외국인들이 자신을 통해 한국을 패셔너블한 나라로 인식하는 게 보람 있다고 했다.
지난해 94명뿐인 파리의상조합 정회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입지도 달라졌다. 파리의상조합은 파리컬렉션을 주관하는 단체. 그는 가입 뒤 파리 남성복 패션위크 기간의 ‘황금타임’인 토요일 오후를 차지했고, ‘꼭 봐야 하는 컬렉션’ 열 손가락 안에 들었다. 까다로운 프랑스 패션이 마침내 한국 여성 디자이너를 로열 멤버로 받아들인 것이다.
-의상조합 입성 계기가 있었나요.
“아뇨. 파리는 정말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도시예요. 한국처럼 얼른 뭐가 결정되고 그러지 않죠. 가짜는 살 수가 없어요. 컬렉션 나가던 초창기에 르 피가로에서 저를 호평하는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럼 제 쇼에 바이어들이 벌떼같이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입소문으로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야 서서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도 한참 판단을 유보하고요. 신데렐라는 없어요.”
-회원이 된 뒤 특전은 뭔가요.
“누구도 제 쇼 시간을 뺏을 수 없죠. 그간 좋은 시간대에 걸려도 디오르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 뺏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젠 내가 싫다고 하기 전까진 절대 못 건드려요. 외국인으로서 받는 차별도 사라졌고.”
이런저런 시도하며 아직도 ‘졸이는’ 중
그는 파리와 서울을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오간다. 파리에 독립법인을 만들고 디자인팀과 세일즈 디렉터 등 현지 인력을 보강했다. 내년엔 파리 마레지구에서 열었던 단독매장을 확장 이전해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규모를 키웠다. “한국의 글로벌 디자이너가 왜 서울에 단독매장이 없느냐”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월 부랴부랴 ‘멘 메이드 우영미’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열었다. 5층 건물에 카페와 작은 전시공간, 멀티숍까지 들어가 있다.
-외국인 디자이너들과 컨셉트 공유가 잘 되나요.
“브랜드가 훨씬 더 글로벌해졌어요. 그 전에는 우리끼리 동양사람 몸에 국한돼 생각했었죠. 마네킹도,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는 현지팀하고 하니까 똑같은 옷을 보고도 생각과 느낌이 달라요.”
-파리에서 느낀 ‘글로벌 브랜드’의 조건은 뭔가요.
“가장 큰 무기는 파리에 있다는 그 자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거기에 브랜드 DNA가 생기는 세월도 무시 못해요. 한마디로 헤리티지죠. 대중이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DNA가 되려면 많이 ‘졸여야’ 해요. 이 소스도 넣어보고, 저 소스도 넣어보면서요. 그러니 브랜드가 크는 동안 좀 기다려 주는 시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아쉽죠.”
그는 아직도 자신은 ‘졸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컬렉션을 하며 매번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브랜드를 정리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동시대 사람들과의 교감은 또 하나의 ‘소스’로 작용한다. “그래서 패션은 살아 있는 생물체예요.”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월급 끊긴 간호사와 환자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ae147254-79ab-4abf-8f36-504f36f57bc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