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50분 플로리다 도착→8시45분 플로리다 탬파 유세→오후 1시15분 버지니아 리치먼드 유세→3시25분 시카고 도착→4시10분 시카고에서 조기투표(일종의 부재자 투표)→8시15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유세→11시5분 백악관 도착.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시간표다. 대통령 선거일을 열이틀 남겨놓은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다. 새벽에 출발해 밤 11시가 넘어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특히 오바마는 24일부터 이틀간 8개 주를 방문하는 ‘48시간 유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열린 유세에서 그는 “여기는 48시간 마라톤 유세 가운데 두 번째 방문지”라며 “우리는 지금 48시간 동안 잠자지 않고, 커피 몇 잔만 마시는 밤샘 장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웃었다. 그의 목은 이미 쉬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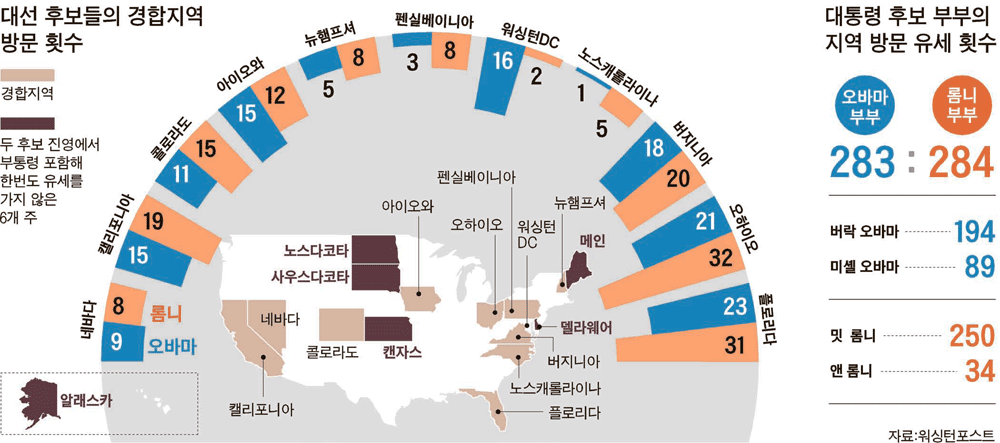
반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24일 네바다·아이오와, 25일 오하이오를 방문한다. 롬니는 하루에 여러 개 주를 도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여러 도시를 누비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롬니는 24일 네바다주 레노시에서 열린 유세 때 “오바마 캠프가 바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미 세는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롬니가 유세에서 “승리”를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시험’을 코앞에 남겨놓고 두 후보의 일정표는 정책만큼이나 다르다. 오바마가 하루에 여러 개 주를 날아다니는 융탄폭격형이라면 롬니는 하루에 한두 개 주만 골라 집중 공략하는 정밀타격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마지막 토론 후 오바마는 도전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롬니는 선두주자(front-runner)처럼 뛰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지난 22일 마지막 3차 TV토론을 마친 뒤 두 후보의 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전략지역에만 화력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후보의 동선에는 2012년 미국 대선의 승부처라는 코드가 숨어 있다. 50개 주나 되는 만큼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표의 효과가 큰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145일간 오바마와 롬니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도 철저하게 이 원칙을 증명하고 있다.
오바마가 이 기간 중 194개 지역을 방문한 반면 롬니는 250개 지역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의 업무를 병행하는 오바마로선 동선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플로리다(23회)·오하이오(21)·버지니아(18)·아이오와(15)의 순이다. 역대 미 대선에서 최대 접전지이자 몇 % 차이로 승패가 판가름 나는 스윙스테이트(부동층이 많은 경합주)들이다. 지난 3일 첫 TV토론에서 롬니에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뒤 오바마의 동선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표의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텍사스처럼 공화당의 아성 지역을 간간이 찾았지만 철저하게 전략지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롬니가 가장 많이 찾은 곳도 오바마와 비슷하다. 오하이오(32회)·플로리다·버지니아(20)·콜로라도(15)의 순이다. 롬니 캠프에선 콜로라도를 ‘행운의 땅’으로 여긴다. 10월 3일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이긴 뒤 내내 끌려다니던 선거를 초박빙으로 몰고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2일 마지막 TV토론 뒤 제일 먼저 찾아간 곳도 콜로라도다.
반면 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캔자스·메인·델라웨어·알래스카 등 6개 주는 145일 동안 두 후보는 물론이고 부통령 후보들조차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캔자스는 선거 때마다 공화당이 승리한 곳이고, 메인·델라웨어는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다. 미 대선은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다.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