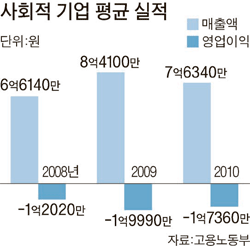
서울 장위동에 있는 노란들판은 장애인 14명을 채용해 현수막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 양현준 이사는 “올 초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매달 1000만원가량 나오던 정부의 인건비 보조가 지난해 말 뚝 끊겼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최장 3년이다. 양 이사는 “월 2000만~3000만원인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인력을 줄이거나 봉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처지”라고 털어놓았다. 간병 서비스를 하는 A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해 오던 수준이었으나 얼마 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자생력 확보다. 2007년 이래 정부가 사회적 기업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7200억원.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인건비 보조였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뒷걸음질했다. 사회적 기업의 영업손실 폭은 2008년 평균 1억2000만원에서 2010년 1억7300만원으로 늘었다. <표 참조> 2010년 매출 평균은 7억6300만원. 100원어치를 팔면 22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 민간 기업에 비해 마케팅과 가격·품질 경쟁에서 밀리는 마당에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중독성이 있는 인건비 지원보다는 판로나 마케팅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현재 30% 수준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매출 비중을 절반까지 높이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공구매 지원을 아쉬워했다.
업체 간 사업 아이템 베끼기도 문제다. 주로 과자나 빵 제조, 청소·간병 서비스 같은 단순한 사업을 하다 보니 차별화가 쉽지 않은 데다 ‘사업이 된다’ 싶으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장애인과 노인을 고용해 지하철 퀵서비스 사업을 하는 B사의 김모 대표는 “후발 주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익 내기가 버겁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별 중복 지원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로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농어촌공동체’(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사업 내용이 겹친다. 정부는 이들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익명을 원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 인증·지원을 주도하면서 본질에서 동떨어진 일자리 늘리기, 숫자 채우기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