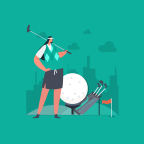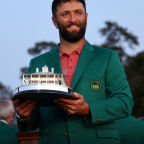요즘 허수경 시인은 20세기 시인의 전기를 읽고 있다. 그는 “억압 당하는 팽팽한 긴장 속에도 문학을 놓지 않는 정결함을 새기고 싶었다”고 했다. [사진 문학동네]
요즘 허수경 시인은 20세기 시인의 전기를 읽고 있다. 그는 “억압 당하는 팽팽한 긴장 속에도 문학을 놓지 않는 정결함을 새기고 싶었다”고 했다. [사진 문학동네]이 가을의 무늬
아마도 그 병 안에 우는 사람이 들어 있었는지 우는 얼굴을 안아주던 손이 붉은 저녁을 따른다 지난 여름을 촘촘히 짜내렸던 빛은 이제 여름의 무늬를 풀어내리기 시작했다
올해 가을의 무늬가 정해질 때까지 빛은 오래 고민스러웠다 그때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너를 조금씩 잃어버렸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순간 너를 절망스런 눈빛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했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계는 뒤돌아 섰다
만지면 만질수록 부풀어 오르는 검푸른 짐승의 울음같았던 여름의 무늬들이 풀어져서 저 술병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이제 취한 물은 내 손금 안에서 속으로 울음을 오그린 자주빛으로 흐르겠다 그것이 이 가을의 무늬겠다
20년은 한 언어를 잊고도 남을 세월이다. 1992년 허수경(48) 시인은 두 편의 시집을 남기고 독일로 떠났다. 그는 독일어로 고고학을 공부했고, 독일 사람과 결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국어는 생생해졌다. 그는 토굴에서 유물을 찾아내듯 낯선 땅에서 서정의 모국어를 발굴했다. 20년 전에 머물 수 있었던 그의 시어는, 그래서 늙지 않았다.
독일에서 e-메일을 보내온 시인은 “시는 저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저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인간의 모국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요”라고 했다. 시인은 모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늘 쓰고, 읽었다. 한 편의 시가 쓰일 때마다 새 언어가 나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다.
미당문학상 본심에 오른 19편의 시에도 새 언어를 담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대표작으로 꼽은 ‘이 가을의 무늬’에 대해 시인은 “그 동안 이미지를 짜는, 혹은 구성하기만 한 것 같아서 풀어주고 싶었다. 풀어야만 넓고 깊게 보인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나 보다”라고 했다. 시 속의 계절은 무늬처럼 희미하다. ‘검푸른 짐승의 울음같았던 여름의 무늬’가 지나가면 ‘취한 물은 내 손금 안에서 속으로 울음을 오그린 자주빛으로 흐르는’ 가을의 무늬가 됐다. 시인은 “단단한 것보다 무늬로만 일렁거리는 감성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줄곧 모국어를 잊을까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덕분에 유목민의 눈을 가진 시인을 얻었다. 그는 시 ‘이국의 호텔’에서 ‘슬픔이라는 조금은 슬픈 단어를 호텔 방 서랍 안에 든 성경 밑에 숨겨둔다’고 했다. 또 ‘섬이 되어 보내는 편지’에서는 ‘섬에서 그대들은 나에게 아무 기별도 넣지 않을 것이며 섬에서 나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며 고독을 이야기했다. 그는 “고독은 시인의 양식이고 뮤즈다. 고독해야만 보이는,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이 있다”고 했다.
시인은 지난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11월엔 연희문학창작촌에 머물며 시를 쓰기도 했다. 독일로 돌아가서는 한참을 향수병에 시달렸다. 그러니 지난 1년 동안 발표한 19편의 시는 모국에 대한 설렘과 그리움의 강력한 자장 안에서 쓰여졌으리라. 시인은 편지 맺음말에 이렇게 적었다.
“서울은 가을이 왔나요? 초가을 고향의 강가에 앉아 보리밥에다 끝물이 든 여름 채소를 넣고 끓인 어탕 한 그릇 하고 싶다는 생각, 이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허수경=1964년 경남 진주 출생. 87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시집 『혼자 가는 먼 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등.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