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며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며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한국 중학생 300여 명과 일본인 중학생 72명이 방학 중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다. 양국 학생들은 10여 명 단위로 조를 짜 공항체험관 안에서 영어로 대화를 했다. 체험관 안은 출입국관리소·환전소·면세점·기내 등으로 구성돼 실제 공항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직접 써보도록 꾸며졌다. 이경민(14)양은 “일본 학생들과 같은 조가 되니 한국 학생들하고만 있을 때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된다”고 말했다.
14일 둘러본 부산시 부전동의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의 모습이다. 이 빌리지는 부산시가 2009년 308억원을 들여 지은 뒤 민간에 운영을 맡겼다. 규모는 1만8718㎡로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의 14분의 1 수준. 하지만 지난해 5만5000명이 방문해 이용자가 파주(2만1538명)의 두 배가 넘는다. 문주상 기획마케팅부장은 “첫해를 제외하곤 매년 흑자를 낸다”고 말했다.
비결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에 있다. 설립 초기 두 기관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영어마을을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내 초등 6학년생 3만5000명이 학기 중 이틀에 걸쳐 17시간 공항체험 등 50여 가지 영어교육을 받는다. 교육청은 영어마을에 매년 교육비로 10억5000만원(학생 한 명당 3만원)을 지원한다. 이곳에서 받은 교육은 정규 학교수업으로 인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마을로선 안정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시교육청으로선 공교육을 보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숙사를 짓는 대신 주변의 동서대·동의대 등 대학기숙사를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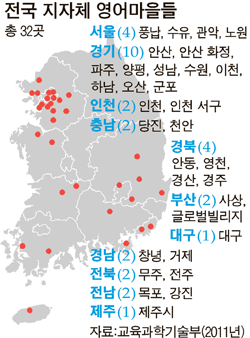
전문가들은 이곳의 비결이 다른 영어마을에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교육청 협조가 없으면 영어마을들은 학기 중 학생을 유치하기 힘들다”며 “영어마을 체험을 학교 영어수업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영어마을을 연구한 호원대 행정학과 김정수 교수는 “지자체들이 영어마을 운영을 민간위탁 한 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에서 영어마을 사업 분야를 명확히 하고 담당 부서를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이유정 기자
◆영어마을=공항·음식점·상점·은행·병원 등 일상생활시설을 가상으로 꾸며 놓은 일종의 영어 테마파크다. 외국인이나 내국인 영어강사가 상주하며 방문객과 영어로 대화를 한다. 2000년대 초반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해외 영어 연수 열풍이 불자 이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마을당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을 들여 조성에 나섰다. 첫 영어마을은 2004년에 문을 열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32곳이 있다. 극소수를 빼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애나 키우라는 시모…"나쁜 며느리 돼라" 정신과 의사가 깨달은 것 [마흔공부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0/66ac3767-cd4b-4fdf-a568-90fd486a334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