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한 노점상 청년의 분신으로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물체 같았다. 호스니 무바라크와 무아마르 카다피 등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것 같았던 폭군들이 힘없이 쓰러지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치지형은 완전히 재편성됐다. 하지만 시리아에만은 그 훈풍이 닿지 않고 있다. 처음 남부도시 다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지 18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인권단체가 집계한 사망자는 최소 2만1000여 명, 난민은 15만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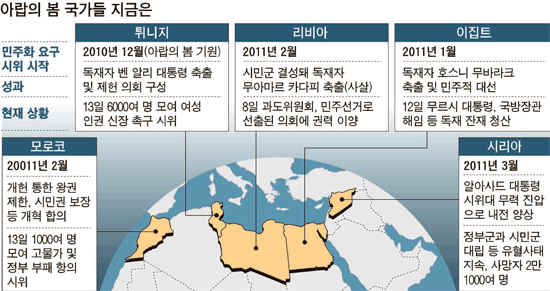
아랍의 봄이 시리아에서 ‘교착상태’를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시리아 사태가 종파 분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에서는 소수인 알라위파(시아파 분파)가 다수 수니파를 통치하고 있다. 시아파는 전체 국민의 10% 내외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70% 이상인 수니파를 탄압해 왔다.
사실 처음부터 시리아 사태가 종파 분쟁 양상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조롱하는 낙서를 한 어린이가 보안부대에 끌려가 고문당하면서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다. 다라와 홈스 등 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금요기도회가 끝난 뒤 연좌시위 등 비무장 평화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알아사드 정권이 탱크와 군함까지 동원해 유혈진압에 나서자 알아사드를 옹호하는 시아파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하게 됐다. 6개월이 지나자 탈영병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세력도 무장을 시작했고,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피의 보복이 시작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에는 민주화라는 큰 명분보다는 시아파 궤멸이 더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자(balancing force)로 일컬어지는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도 아랍의 봄이 시리아에서 막힌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시리아는 이란-이라크-레바논(남부 헤즈볼라 세력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지대’의 중심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다. 이란이 직접 친정부 민병대 육성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리아 상황에 개입하는 이유다. 반대로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 국가들은 반정부 세력 편에 서 있다.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펼치는 대리전도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든다.
유지혜 기자
![[오늘의 운세] 4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