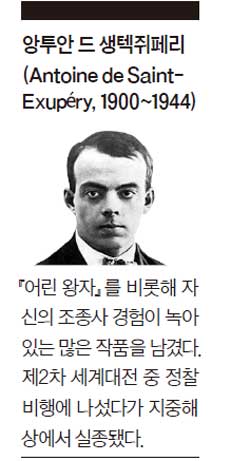
누구에게나 첫 비행이 있다. 기나긴 준비과정을 거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껴질 때 선배가 해주는 한마디는 큰 힘이 된다.
“폭풍우나 안개, 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런 때는 자네보다 먼저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을 떠올려 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남들이 해낸 일은 나도 꼭 할 수 있다’고.”
생텍쥐페리가 조종사로서 처음 비행에 나서기 전날 밤 기요메는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다. 거기에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었다.
박정태의 고전 속 불멸의 문장과 작가 <16>『인간의 대지』와 생텍쥐페리
“한 직업의 위대함이란 어쩌면 사람들을 이어주는 데 있을지 모른다. 진정한 의미의 부(富)란 하나뿐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부니까. 우리는 오직 물질적인 부를 위해 일함으로써 스스로 감옥을 짓는다. 우리는 타버린 재나 다름없는 돈으로 우리 자신을 고독하게 가둔다. 삶의 가치가 깃든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살 수 없는 그 돈으로.”
친구와의 오래 묵은 추억, 함께 겪은 시련을 통해 영원히 맺어진 동료와의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다. 『인간의 대지(Wind, Sand and Stars)』는 바로 이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전해준다. 세 대의 비행기가 연속해 불시착했던 그날 밤,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추억을 이야기하고 농담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한없이 가난했다. 바람, 모래, 그리고 별. 그럼에도 어두침침한 그 식탁보 위에서 추억말고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닐곱 명의 사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
생텍쥐페리는 1935년 파리~사이공 간 비행시간 신기록을 세우려다 리비아 사막에 추락한다. 그는 물 없이는 19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곳에서 갈증에 시달리며 5일간이나 걷고 또 걷는다. 신기루에 수없이 속다 더 이상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끝내는 절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른다. “사막,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이제 침을 만들 수 없다. 태양 때문에 내 안에서 눈물의 샘이 바싹 말라버렸다. 희망의 숨결이 바다 위의 돌풍처럼 내 위를 스쳐 지나갔다.”
이 순간 그는 한겨울 안데스산맥을 횡단하다가 일주일이나 실종됐던 기요메를 기억한다. 그는 우편 행낭을 뒤집어쓴 채 48시간을 기다리다가 눈보라 속을 닷새 낮과 나흘 밤 동안 걸었다.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면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는 생각하겠지. 만약 내가 살아 있다면 걸을 거라고. 동료들도 내가 걸을 거라고 믿을 거야.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있어. 그러니 걷지 않는다면 내가 나쁜 놈인 거야.”
그는 깨닫는다. 조난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난당한 이들은 바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는 조난자들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만약 내가 이 세상에 혼자였다면 나는 그냥 뻗어버렸을 거야.”
인간의 위대함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 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책임. 그리하여 마침내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힘들었던 기억이 펼쳐주는 마술 같은 맛을 만끽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진리는 이처럼 역설적이다.
생텍쥐페리는 마드리드 전선에서 겪었던 이야기로 『인간의 대지』를 마무리한다. 사령부에서 하달한 부조리하고도 무모한 공격 명령에 따라 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지를 향해 나서는 중사, 그는 출발하면서 빙그레 웃는다. 이 순간 사람들은 더는 말이 필요 없는 일체감을 느낀다.
“우리 외부에 있는 공동의 목적에 의해 형제들과 이어질 때, 오직 그때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동료란 도달해야 할 같은 정상을 향해 한 줄에 묶여 있을 때만 동료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돌아가는 노동자 수백 명이 탄 열차 3등칸에서 비참함과 더러움으로 진흙덩어리가 돼버린 인간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황금사과 같은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여기에 음악가의 얼굴이 있구나. 여기에 어린 모차르트가 있구나. 여기에 생명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구나. 보호받고 사랑받고 잘 교육받기만 한다면 그 아이가 무엇인들 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는 모차르트를 괴로워한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비참함 속에서 그저 잠든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직 정신만이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고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같은 나무에 난 가지들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서로서로에게 감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을 인간으로 알아주는 상대 앞에서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박정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기자를 지냈다. 굿모닝북스 대표이며 북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