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 향매실마을에서 5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매화나무를 처음 심었던 황순례씨(왼쪽)가 수확한 매실을 보여 주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
전남 순천시 향매실마을에서 5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매화나무를 처음 심었던 황순례씨(왼쪽)가 수확한 매실을 보여 주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지난 10일 오후 2시쯤 전남 구례에서 국도 17호선을 따라 가다 보니 ‘향매실마을’이란 간판이 보였다. 마을로 들어서자 길 양편으로 어른 키보다 좀 큰 나무마다 상큼한 매실이 달려 있었다. 전남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이문마을이다.
이문마을과 이웃 외동마을은 ‘향매실마을’로 더 알려져 있다. 이곳에선 요즘 하루에 10㎏짜리 2000상자 안팎의 매실을 출하하고 있다. 향매실영농조합법인 김선일(49) 대표는 “출하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10~15% 더 비싸다”고 자랑했다. 알이 가장 굵은 ‘왕특’은 상자당 5만8000~6만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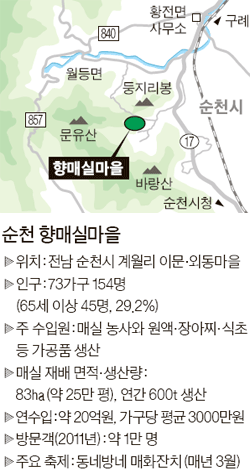
향매실마을은 73가구 중 88%인 64가구가 매실 농사를 짓는다. 재배 면적이 83㏊(25만 평)로 마을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넓다. 지난해 매실 생산량은 약 600t으로 생과와 가공품(원액·장아찌 등) 판매액을 합쳐 약 2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가구당 평균 3000만원가량 된다. 제갈병규(64)씨는 “매화나무 500그루를 가지면 연 4000만원을 벌 수 있어 웬만한 도시 월급쟁이 부럽지 않다”고 말했다.
매실과의 첫 인연은 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던 이택종(1997년 작고)씨가 귀향하면서 매화나무 묘목 200그루를 가지고 와 심었다. 부인 황순례(69)씨는 “남편이 이웃들에게도 ‘우리 동네 기후·토질이 딱 맞다. 매실이 건강에 좋아 각광받을 날이 온다’며 재배를 권했다”고 기억했다.
처음에는 세 집만 따라 심었으나 이후 하나 둘씩 재배농가가 늘어났다. 하지만 전남 광양 매실 등에 치여 빛을 보지 못했다. 마을이 광양보다 북쪽에 자리 잡은 산지로 평균 기온이 2~3도 정도 낮아 매화 개화와 매실 수확 시기가 2주일 정도 늦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름의 강점이 있었다. 향매실마을은 문유산(해발 688m)·바랑산(해발 620m)·병풍산(해발 500m)으로 둘러싸인 해발 250m 안팎의 지대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 또 흙에 모래가 섞여 물 빠짐이 좋다. 덕분에 다른 매실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약리 성분이 많다.
2000년대 들어 이 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탔다. 마을 주민들은 2005년 ‘향매실’이란 브랜드를 론칭했고 품질관리도 더 철저히 했다. 영농조합법인도 만들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수도권 도매시장으로만 물건을 보내는 전략을 썼다. 또 봄마다 ‘동네방네 매화잔치’를 열고 매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한 해에만 1만 명 이상의 도시민이 다녀갔다. 이 덕분인지 향매실마을엔 최근 16가구가 새로 이주해 오거나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중앙일보·농림수산식품부 공동기획
![[단독] 尹 "이재명 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전화해 국정 논의할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c42890d4-2b28-49cb-8172-182240557cb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