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실마을을 찾은 농협 대구지역본부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엿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개실마을을 찾은 농협 대구지역본부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엿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 개실마을. 조선 초기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관을 쪼개 시신을 베는 극형)당한 영남 사림의 종조(宗祖) 김종직(1431∼92)의 6대손이 1650년대부터 은거하면서 자리 잡은 선산 김씨 집성촌이다. 제사와 차례를 전통 방식대로 지내는 이 마을 주민 98명 중 대다수는 20촌 이내로 여전히 촌수를 따지고 있다.
요즘 이 양반 마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던 전통을 털고 외지인이 사시사철 찾는 전국 유수의 농촌 체험마을로 탈바꿈한 것이다.
4일 찾아간 개실마을에선 농협 대구지역본부 소속 고향주부모임 회원 70여 명이 엿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었다. “자∼오른손으로 쥐고 왼손으로 반쯤 감아서 지그시 당기시소. 많이 당길수록 하얘지고 구멍이 많애지니더.” 진행자인 이 마을 성월희(65·여)씨의 설명에 따라 두 명씩 팀을 이룬 여성 참가자들은 2∼3m 길이 엿가락을 죽죽 뽑아냈다. 대구에서 온 추미화(48·여)씨는 “어릴 적 어머니 몰래 고무신을 내주고 바꿔 먹던 엿이 생각난다”며 가족에게 맛보일 엿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날 체험장 밖에서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민 70여 명이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다. 멀리 호남 땅까지 개실마을 농촌체험이 알려지면서 운영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지난해 개실마을 방문객은 4만70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이 쓰고 간 돈은 3억4000만원에 이른다. 농사 수입 외에 가구당 평균 1200만원의 가외소득을 올렸다. 올해는 5만5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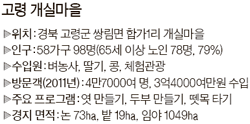
체험마을 구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2001년 행정자치부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기로 체험마을 운영이 시작됐지만 전통적인 양반 체면 문화가 걸림돌이었다. 이때 변화의 계기를 만든 사람이 군청 공무원 김광호(46)씨다. 그는 2004년부터 3년간 출근 전과 퇴근 후 마을에서 살다시피 하며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우면서 체험마을 가꾸기에 정성을 쏟아부었다. 대구 등 대도시를 돌며 마을 소개 팸플릿도 돌렸다.
개실마을영농조합 김병만(70) 대표도 이런 변화에 동참했다. 체면을 접고 방문 학생을 손자·손녀처럼 대하고 정성스레 음식을 내놓았다. 입소문을 타고 2006년부터 방문객이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주민들은 제사상에 올리던 엿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였다. 민박객을 위해 한옥에 현대식 화장실과 목욕탕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관광대학·에버랜드 등을 다니며 친절교육을 받았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것이다.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쌀·딸기·조청·고추장 등 농산물 직거래도 늘어나 한 농가가 연간 1000만원 이상 판매한다. 올해는 한과 재료 사업을 시작한다. 김 대표는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최근 2∼3년 사이 대도시에서 정년을 마친 일가친척 등 5가구가 귀농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농림수산식품부 공동기획
![[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2f771d18-42c5-436f-8494-68e4fd1e2fa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