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과 프랑스의 보불 전쟁(1870~71)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다. 전리품으로 제철 중심지 알자스로렌을 얻게 된 독일은 좋은 철을 만드는 데 요새 말로 국가적인 힘을 기울였다.
김제완의 물리학 이야기 양자(量子)의 탄생
그런데 좋은 철을 만들려면 용광로의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온도에서 제련하는가에 따라 철의 강도와 탄성이 달라진다. 지금은 전자칩인 서모 커플(Thermo Couple)로 용광로 온도를 전자적으로 측정하지만 당시엔 숙련공들이 용광로 내 불 빛깔로 가늠했다. 중요한 제철 산업이 과학보다 사람의 감각에 의지하는 게 불안했던 독일은 오늘날처럼 대학에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 용광로 속 온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장려했다.
이런 투자 덕에 열역학으로 알려진 물리학의 한 분야가 전성기를 맞았고 차츰 빛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광학(分光學)의 시대로 넘어갔다. 이 분야 개척자들은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는 맥스웰(J.C. Maxwell), 패러데이(Faraday), 헤르츠(Hertz)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 전자기(電磁氣)학의 개척자에 의해 전파의 속도가 빛과 마찬가지로 초당 30만㎞이며 빛도 파장이 짧은 전파라는 게 알려지게 됐다. 그럼에도 아직은 알자스로렌의 제철 사업에 꼭 필요한 빛과 열의 관계까지는 널리 연구되지 않았다.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을 많이 내는 적외선은 빛보다 파장이 짧은 전파이고, 극히 짧은 파장인 X선도 전파이며, 열을 낸다. 빛을 포함해 모든 전파는 열을 만든다. 그래서 당시 본(Bonn)대학의 물리학 교수이자 빛과 전파, 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막스 플랑크 (사진) 박사는 용광로 속 빛의 색깔로 온도를 귀신같이 알아내는 숙련공의 감각을 과학 이론으로 정리하려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특히 집중 연구한 것은 열의 중간지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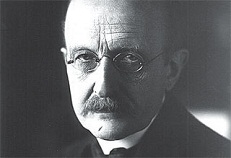
복사의 법칙이라 불리는 열 원리는 당시 저온과 고온 파트에는 나름대로 이론이 있었다. 저온엔 영국의 레리와 진스가 내놓은 초보적 이론이 있고 고온엔 빈의 법칙(Wien’s law)이란 게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온과 고온의 공백을 연결하는 이론은 많은 학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다.
그 공백을 플랑크가 알아냈다. 한데 그 방식이 과학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리저리 꿰 맞추다 우연히 정답을 발견한 식이었다. 그게 박사는 못마땅했다. 기초과학에선 결과보다 도출 과정과 논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박사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 고민했다.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연의 연속성이 실제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오는 빛의 강도는 진폭을 연속적으로 조절하면 연속적으로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띄엄띄엄 변할 수 있겠다는 가정이었다.
빛의 강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면 강도의 합은 그냥 더하면 된다. 단순한 산수다. 그러나 연속적이라면 다르다. 적분을 해야 한다.(적분은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학생이 골치를 싸매는 수학적 수단이다.) 플랑크 박사는 빛의 강도, 즉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산했다.
그렇게 한 결과 놀랍게도 추정대로 복사열의 에너지 공식이 나왔다. 박사는 몇 주를 망설이다 발표했다. 복사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이며 그리고 복사열의 최소단위인 ‘양자(量子)’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골치 아픈 이론의 하나인 ‘양자론(量子論)’의 탄생이다. 당시는 엄두도 못 낼 생각이었다.
양자론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맛보기로 약간 설명한다면 에너지는 연속적이 아니고, 최소 에너지량인 h(플랑크 상수)의 배수라는 것이다. h는 6.63×10-34승J(줄)의 에너지를 1초간 공급하는 것이다. 양자가 10의36승(즉 10억×10억×10억×10억)개 있어야 30와트짜리 전등 하나를 1초간 밝힌다. 그보다 작은 에너지 뭉치는 없다.
플랑크의 양자 개념을 재빨리 다른 곳에 응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20세기가 낳은 과학의 영웅이며 천재의 대명사인 박사는 전파나 빛은 그때 대부분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동이 아니며 수많은 양자로 이뤄져 있다고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빛이 광양자(光量子)의 흐름이라는 생각은 혁명적이었다. 그 개념은 아인슈타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겼다.
플랑크의 양자론이 왜 그리 획기적이고 나아가 현대 물리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반도체·레이저 등 현대 기술의 90%가 이를 바탕으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습과 실체조차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문재(文材)가 넉넉지 못해 우주의 실체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이 주제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다음엔 마음과 양자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써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