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의 위기 극복에 유로존 문제 해법의 열쇠가 있다.” 마이클 하젠스탑(38·사진)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채권그룹 수석 부사장의 말이다. 그는 자산규모가 596억 달러(약 67조원)인 ‘템플턴글로벌채권펀드’를 포함해 총 1650억 달러(약 185조원)의 돈을 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를 ‘채권왕’ 빌 그로스(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아일랜드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였다고 한다. 당시엔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일랜드 국채를 팔아치우는 상황이었다. 이후 아일랜드 국채는 현재까지 35% 넘게 올랐다. 템플턴글로벌채권펀드는 연초 이후 6.7%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리스크가 크다”는 비판도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하젠스탑 부사장에게 e-메일로 ‘아일랜드의 귀환’에 대해 물었다.
-아일랜드 국채를 샀다(※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템플턴글로벌채권펀드’는 약 27억 달러의 아일랜드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일랜드의 귀환’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여름, 그리스 위기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아일랜드의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3%다. 2010년에는 이른바 유로존 주변국 최초로 GDP 대비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상수지가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난 이유가 뭔가.
“두 가지다. 먼저 숙련된 노동력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유로존 국가다. 환율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제조 부문의 단위당 노동비용을 20% 떨어뜨렸다. 노동생산성을 높인 것이다. 환율을 20% 낮추는 것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8년 이후 무역흑자가 두 배로 늘었다. GDP가 늘어나면서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과 IMF가 정해 놓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이유는.
“친(親)기업적인 규제와 세금 환경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법인세를 12.5%로 높이라는 EU 국가들의 압력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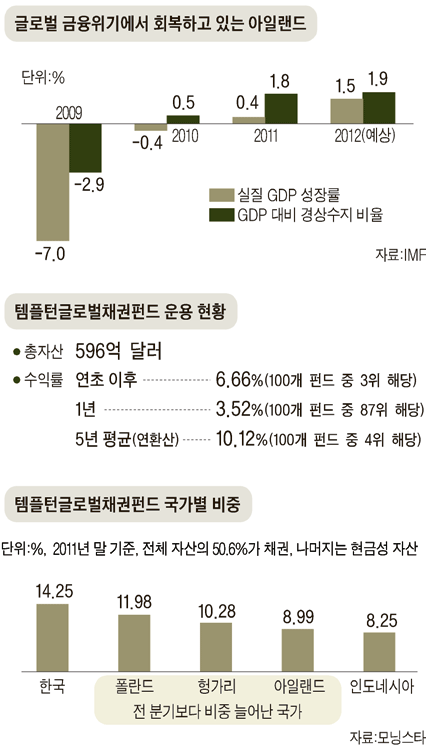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다. 긴축재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아일랜드 국민 간에는 폭넓은 사회적·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긴축재정이 쓰라린 경험이지만 아일랜드 국민은 그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도 개혁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
-올해 글로벌 자산시장을 전망해 달라.
“아시아·스칸디나비아·중부유럽·남미 등을 좋게 본다. 미국 달러와 유로화, 엔화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