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드뷔시에게 연인이 있었다. 양복점에서 일하는 소박한 아가씨 가브리엘 뒤퐁. 충직하고 착한 그녀의 애칭은 개비였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초보 작곡가 드뷔시(그림)는 가난했지만 개비가 있었기에 위축되지 않고 창작의 꿈을 키워갔다. 둘은 1887년께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개비에게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릴리 텍시에. 빈곤해도 마냥 다정한 두 사람의 생활을 지켜보며 릴리는 다정한 벗이 되어주었다. 1899년 드뷔시는 릴리 텍시에를 아내로 맞이했고 개비는 자살을 기도했다. 그 와중에 드뷔시는 관현악곡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성공시켰고 연이어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상드’를 발표해 절정의 명성을 구가하게 된다. 이 무렵 드뷔시는 아름다운 음악가 에마 바르다크를 만나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 결국 아내 릴리를 버리고 에마와 결혼한다. 1905년의 일이다. 버림받은 아내 릴리도 개비처럼 자살을 기도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난다. 이미 드뷔시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은둔지로 잠적해야 했다. 만남, 결별, 자살의 사이클이 반복되던 끝에 완성된 작품이 그의 대표작 ‘바다’였다.
詩人의 음악 읽기 클로드 드뷔시
‘귀 기우려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 위에 무수한 밤이 왕래 하나/ 길은 항시 어데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아 스스로히 푸르른 정열에 넘쳐/ 바다의 깊이 위에/ 네 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애비를 잊어버려/ 에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포를 잊어버려/ 마지막 네 계집을 잊어버려….’(서정주, 바다)
청년시인 서정주가 쓴 ‘바다’는 포효하듯 외치는 시다. ‘네 계집을 잊어버려’에서 드뷔시의 고단한 연애사를 떠올린다. 길은 어디나 있고 결국 아무 데도 없다고 했는데 드뷔시는 길을 찾았을까. 어쩌면 그런지도 모른다. 지휘자 피에르 불레즈는 ‘목신의 오후’와 ‘바다’를 현대음악의 출발점이라고 평했는데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바다’를 초연한 직후 드뷔시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전통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로 인해 새로운 음악사가 출발했다는 주장이다. 정확한 명칭으로 ‘대오케스트라를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는 1. 바다 위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2. 파도의 장난 3. 바람과 바다의 대화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랄까. 시작부터 끝까지 출렁출렁한다. 소리가 왕복운동을 하는 음악이다. 분석적이고 악상이 명료한 재래의 음악과는 판연히 달라서 곡의 얼개와 멜로디가 포착되지 않는 반면에 거대한 바다라는 이미지 한 덩어리가 전체를 지배한다. 현대회화에서 말하는 ‘뜨거운 추상’을 떠올리면 될 것 같다(그런데 쓰고 보니 이지적인 차가운 추상이 아닌가도 싶네. 어쨌든 우리 관념 속 추상회화의 전형으로 여기면 될 것 같다).
내게 ‘바다’는 바그너 음악과 매우 겹쳐지며 다가온다. 실제로 젊어 한때 열광적 바그넬리언(바그너 예찬자)이었다가 철천지원수처럼 돌아선 드뷔시인데 바그너식 무한선율의 잔영이 아주 짙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 상식 속에 바그너 음악과 드뷔시 음악은 얼마나 다른가. 좀 엉뚱한 얘기지만 그토록 달라보이는 두 음악가에게서 추출되는 공통성이 복잡한 사생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본다. ‘바다’를 작곡할 때 드뷔시의 삶은 여난(女亂)으로 전전긍긍이었고 바그너는 일생이 스캔들의 연속이었다(바그너 초상화에서 코의 크기를 주목해 보라). 여난으로 곤경에 처해 심란할 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미칠 듯이 화가 난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이 남녀상열지사의 귀결이다. ‘바다’에서 우렁우렁한 대목들, 특히 3악장 바람과 바다의 대화는 거대한 파도소리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소리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그너 오페라의 고함과 신경질을 떠올려 보라. 웬만한, 든든한 신경줄을 지니지 않았으면 편히 감상할 수 없는데 그런 난폭한 음악을 만들어 내는 동기가 어디에서 기인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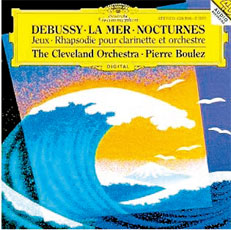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한 드뷔시의 ‘바다’ 음반.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한 드뷔시의 ‘바다’ 음반. 음악사에서 현대음악이 드뷔시에서 출발한다고 하든 바그너라고 하든 마찬가지다. 현대음악의 출발점은 울화와 신경질이다. 선사 틱낫한이 말하길 화는 아기라고 했다. 달래고 어르고 놀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드뷔시의 예술성을 우러러 볼 일이 아니라 어린 아기 드뷔시를 어르고 달래주듯이 들어줘야 한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아는 사내들 대부분이 너무나 드뷔시다. 그래서 ‘바다’가 ‘짱’이다. 그런데 드뷔시는 보편적인 바다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일회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바다를 표현했다고 한다. 누가 아니래나. 모든 연애가 비슷비슷해 보여도 각자에게는 소중하고 고유한 일회적 사건이다. 우리 바다에게 너무 화내지 말자.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尹 "이재명 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전화해 국정 논의할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c42890d4-2b28-49cb-8172-182240557cb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4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