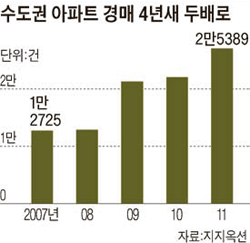
자영업자 박모(50)씨는 몇 년 전 ‘대박’의 기대를 품고 투자한 일이 악몽이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2008년 초 경기도 남양주시 S아파트 128㎡형(이하 전용면적)을 3억8000만원에 분양받았다. 미분양분이어서 분양가보다 3000만원 저렴했다. 입주 후 상당한 웃돈이 붙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다.
하지만 2009년 9월 막상 입주했는데 시세는 분양가보다 떨어졌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기존 집과 새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내밀어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겨우 치렀다. 한 달에 300만원 가까운 대출이자를 2년가량 납부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박씨는 “팔려고 내놓은 지 2년이 넘었지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경매시장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다. 소유주가 2006~2008년 부동산시장 호황기 때 ‘대박’을 기대하고 분양받았다가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겨진 집이 대부분이다. 분양받을 때 예상과 달리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이자만 불어난 것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고양(123건), 용인(82건), 의정부(65건), 파주(57건) 등의 아파트 경매건수가 수도권 시·군 평균(33건)보다 훨씬 많다. 이들 지역 아파트 경매물건 가운데 입주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새 아파트가 눈에 많이 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에서 나온 새 아파트 경매가 크게 늘었다”며 “많게는 전체 경매물건의 30%를 차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경매가 늘면서 전체 경매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건수는 2만5389건으로 전년(2만2708건)보다 11% 늘었다. 지난해 경매건수의 13%(3300가구)가 새 아파트였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고양시 G아파트. 2007년 12월 8억9000만원에 분양됐는데 2010년 3월 입주 후 시세가 7억5000만원으로 내렸다. 이 아파트 계약금은 5000만원이어서 분양받은 사람은 나머지 8억4000만원의 대출이자(월 400만원가량)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분양가 할인 등 혜택에 솔깃해 분양받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 최모씨는 1억원 가까이 할인받고 인천시 Y아파트 148㎡형을 샀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더 싸게도 팔리지 않아 최근 경매로 넘어갔다. 이 아파트 11채가 다음 달 경매에 부쳐진다.
법무법인 무학 박미옥 본부장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시장 침체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경매에 넘어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경매시장에 나와도 쉽게 팔리지 않아 주인을 두 번 울리는 셈이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3~4가구만 낙찰되는 것이다. 낙찰금액도 감정가 대비 72% 수준으로 낮다.
박일한 기자
경매 은행이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채무자가 보통 3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독촉·협의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세입자 등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를 접수한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물건의 평가액을 산정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 경매를 시작한다. 첫 경매에선 감정평가액이 최저가가 되고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일정 비율(지역에 따라 20~30%)씩 내려간다.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