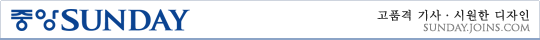소통의 장으로, 남녀의 벽을 허무는 공간으로 찜질방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은 그와 비슷한 속도로 이종격투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채널을 돌리다 이종격투기 중계가 나오면 무서워서 눈부터 질끈 감았다던 어떤 국회의원의 부인이 이젠 매일 새벽까지 피의 향연을 즐긴다고도 한다. 국내 포털사이트를 뒤져보면 이종격투기 관련 커뮤니티가 수천 개에 이른다. 선수의 팬클럽부터, 이종격투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카페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기존 미디어가 채워주지 못하는 뉴스 갈증을 웹진·블로그 등으로 해갈한다. 이종격투기는 199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에서 거의 동시에 스포츠로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차이는 있다. 미국에서는 승부보다는 피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UFC 옥타곤으로 몰려들었고, 일본에서는 링 위의 영웅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며 K-1에 이어 프라이드FC가 발전했다. 최근 UFC 오너가 프라이드를 인수하면서 세계 격투기의 중심은 미국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사진설명> 1. 네덜란드 K-1의 두 영웅 어네스트 호스트(왼쪽)와 레미 본야스키. 2. 6월 17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오디세이 아레나에서 열린 ‘UFC 72’ 대회의 열기. 대회의 테마는 ‘VICTORY’였다. 3. 6월 3일 미국 LA 메모리얼 콜리시엄에서 열린 ‘다이너마이트 USA’. 오랜 라이벌 호이스 그레이시(아래)와 사쿠라바 가즈시의 대결이다. 4. 2004년 7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서울대회’ 결승에서 카오클라이 카멘노르싱(오른쪽)이 고야시 신고를 공격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종격투기의 뿌리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역도산의 수제자 안토니오 이노키가 1976년 7월 5일 프로레슬링의 실전성을 알리기 위해 복싱영웅 무하마드 알리를 초청한 것을 기원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노키는 누운 채로 알리를 기다렸고, 알리는 빙빙 아웃복싱만 한 탓에 싱거운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둘의 대결은 이종격투기의 원시적 형태였다. 이노키는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윌리엄 루스카, 가라테로 곰을 죽인 윌리 윌리엄스와 연달아 맞붙으면서 이종격투기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더 멀리는 40~50년대 세계 각 고수들과 100여 차례의 대결을 벌여 모두 이긴 극진가라데 창시자 최영의로부터 이종격투기가 태동했다는 시각도 있다. 최영의의 제자 이시이 가즈요시 정도회관 관장은 K-1을 창설했다. 어느 무술이, 어떤 사내가 가장 강한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이종격투기는 일본 자본과 손잡고 거대 스포츠로 성장하게 된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전투 본능은 스포츠의 틀을 갖춘 이종격투기로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냈고, 곧 돈이 됐다. 파이가 커지자 돈과 사람들이 더 모였다. K-1의 전설 어네스트 호스트는 네덜란드에서 킥복서로 활동하며 생계를 위해 교도관을 겸해야 했다. 마크 헌트는 2001년 K-1 월드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을 때 5억원 가까운 상금을 차지했지만 이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파이트머니로 20여만원을 받았다.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최홍만의 K-1 진출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한국인의 피는 확실히 뜨겁다. 역도산과 최영의, 그리고 프로레슬링의 국민적 영웅 김일을 시작으로 현대의 유도ㆍ레슬링ㆍ복싱 등 격투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종격투기의 탄생에 힘을 보탠 한국인은 이제 일본이 산업화한 이종격투기를 스포츠로 받아들이며 열광하고 있다.
한국인들도 ‘최강의 영장류’ ‘60억분의 1’ 등의 격투기 홍보문구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최홍만의 승승장구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올해 초 CJ미디어는 K-1 3년 독점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중계권료 등으로 310억원을 쏟아 붓기까지 했다. 프라이드와 UFC 중계권을 가진 온미디어도 만만치 않은 돈을 썼다. 한국인에게 격투기가 그만큼 대중적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충성도 높은 팬을 확보한 것만은 틀림없다. 천창욱 수퍼액션 종합격투기 해설위원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 격투무대에 진출하면서 팬들이 경기에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격투기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고 인지도가 늘어나는 과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맨주먹으로 싸워본 적이 있든 없든 이종격투기는 사람들의 ‘참여욕구’를 자극한다. 동네마다 있던 복싱ㆍ킥복싱ㆍ가라테 체육관은 최근 격투기 도장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고, 수련생 계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채롭다. 서울 대치동의 K-1 칸 짐 관리를 담당하는 박은수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해 매일 체육관을 찾는 여학생도 있고, 한의사·배우·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격투기를 배우러 온다”고 전했다. 요즘은 초등학생 간 막싸움도 입식타격기로 시작해 그래플링으로 끝난단다. 전형적인 관전스포츠였던 격투기는 승부근성이 강한 한국인 사이에서 참여스포츠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식 JES기자 seek@jesnews.co.kr 중앙SUNDAY 구독신청
![[오늘의 운세] 4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