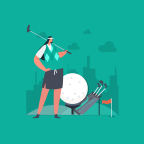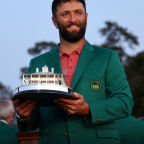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트래비스 엘버러 지음
성소희 옮김
한겨레출판사
영국의 크리스털팰리스, 우리말로 수정궁은 세계 최초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1851년 런던 세계만국박람회 전시장으로 지어졌다. 그 안의 전시품만 아니라, 철골 구조에 판유리를 입혀 화려하고 거대한 온실 같은 위용을 뽐낸 이 전시장 자체도 대단한 구경거리였던 모양이다.
알고 보니 박람회 이후 그냥 철거되진 않았다. 해체와 재조립을 거쳐 전원 지역으로 이전했고, 정원과 볼거리를 갖춘 유원지로 문을 열었다. 가까운 기차역도 생겨났다. 크리스털팰리스로 곧장 이어지는 지하도 역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일등석 기차 손님만 이용할 수 있었다.
![런던의 크리스털팰리스 지하도. 일등석 기차 승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사진 한겨레출판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306/10/25227882-123e-4072-ace4-e8097e54e39a.jpg)
런던의 크리스털팰리스 지하도. 일등석 기차 승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사진 한겨레출판사]
한데 1936년 크리스털팰리스가 화재로 사라졌다. 승객이 줄면서 기차역도 결국 없앴다. 2차 세계대전 때 대피소로도 쓰였던 지하도는 남아 있지만, 대중의 접근은 막혀 있다. 이 책의 원제(Atlas of Forgotten Places)에 담긴 표현처럼 ‘잊힌 장소’다.
이 책의 취향은 별나다. 멋지고 근사하고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아니라 한때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는 곳을 비롯해 버려지고 잊힌 40곳을 소개한다. 장소마다 흥망성쇠의 이유는 뚜렷하다. 그렇다고 하나로 꿸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맛보기로 열거하는 곳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의 케니컷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 구리 수요가 급증하자 철도가 연결되고 광산촌으로 북적였지만, 매장량이 고갈되자 낡아가는 건물 그대로 폐허가 된 곳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 몬트세랫은 비틀즈의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어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스타들을 불러 모았던 곳. 이를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자연. 최악의 허리케인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와 산사태와 진흙이었다.
미국 사막 지역의 리조트 도시였던 솔턴은 더 복잡하다. 한때 관광객이 요세미티국립공원보다 많았다는 이곳은 콜로라도 강의 범람 이후 인공적으로 물길을 바꿔 호수가 생기면서 번성하게 됐지만, 호수의 수위 변화와 오염으로 결국 “황폐한 지옥”이 됐다.
사실 모두 멋지고 근사했던 것도 아니다. 노선 확대로 인적 없이 ‘잊힌 장소’가 된 뉴욕 시청역처럼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병원을 비롯해 장소 자체가 비극을 품은 곳도 많다. 특히 아이티의 상수시궁은 그 역사가 여러모로 처참하다. 식민 지배에 항거한 영웅이 독재자로 변모해 왕을 자처하며 궁전을 지은 데다, 건설 도중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나중에 지진으로 궁은 폐허가 됐고, 독재자는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자의 말마따나 이 책의 장소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책이다. 장소 자체도 그렇지만, 장소마다 그 유래와 역사적 맥락을 잘 짚어내는 서술 덕분이다. 태국의 쇼핑몰이 물고기를 풀어놓게 된 사연은 쇼핑몰 개념의 원조가 된 미국 건축가 얘기를, 소금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 유유니의 기차 무덤은 초석이란 자원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전쟁 얘기를,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될러스하임이 잊힌 이유는 히틀러의 혈통 감추기 얘기를 불러낸다. 저자는 장소마다 해박한 지식을 풀어내며 대중문화사를 비롯해 세계사의 구석구석을 건드린다.
책 제목의 ‘인류의 흑역사’가 풍기는 인상과 달리, 지역 개발 혹은 재생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구석이 많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 시설이나 한때 ‘일본의 하와이’로 홍보된 섬의 호텔이 처한 상황, 잊히고 버려진 곳에 다시 만들어진 관광지나 기념관, 축제 개최 등으로 장소를 되살리려던 시도가 끝내 물거품이 된 곳 등이 각기 다른 영감과 생각 거리를 준다. 장소의 운명이란,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세월의 시험”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 같다.







![이동진 추천책, 하석진 읽던책, 인기 역주행 90년대 소설도 1분기 베스트셀러[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2/f1ca05ae-29c6-4b1c-857b-f214801b4665.jpg/_ir_410x230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