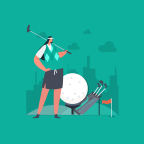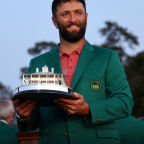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6일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인공지능(AI) 선두주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AI가 강타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가 ‘폐쇄 대(對) 개방’으로 두 쪽이 났다. 챗GPT 같은 AI 모델을 보유한 소수 미국 빅테크가 잇따라 AI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오픈AI는 지난 2월 출시한 챗GPT-4부터 핵심 기술을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만 독점 제공한다. 구글도 최신 AI 모델의 핵심 내용은 비공개다.
폐쇄 진영의 또 다른 축은 중국. 중국의 빅테크들은 정부 통제 하에 사회주의 가치에 충실한 AI를 개발 중이다. 미국 정부가 벤처캐피탈의 중국 AI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기술 봉쇄 상황에도, 자체적으로 데이터ㆍ클라우드 컴퓨팅ㆍ반도체 등 후방 생태계를 두루 노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AI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를 한 데다, AI가 국가 안보 기술로 떠오르자 독점·통제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미·중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AI 시장도 각자 구축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들 뒤를 쫓는 국가·기업은 개방형 AI로 뒤집기 기회를 노린다. 메타(페이스북 운영사)는 오픈소스로 AI 모델을 풀며 이 진영의 선봉에 섰다. 메타의 수석과학자인 얀 르쿤 뉴욕대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AI가 너무 위험하니 규제하자는 주장은 다른 이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I 진영 대결은 15년 전 모바일 생태계 경쟁과 유사하다. 애플과 구글(안드로이드)이 맞섰고, 후방 산업인 반도체를 놓고 미국·중국·대만·한국이 얽혀 성장했으며, 중국은 만리장성 뒤에서 기술 굴기를 준비했다. 치열했던 기술⋅철학⋅산업의 대결은 이제 AI 무대로 옮겨왔다.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4개국 중 하나지만, 선두 그룹의 차단과 후발 주자들의 추격 사이에 낀 처지가 됐다. 오픈AI와 구글은 한국어 AI 수준을 높여 언어의 장벽을 이미 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LG·SK텔레콤·KT 등 5개 대기업이 개발한 한국어 AI 모델들은 새 활로를 뚫어야 한다. 네이버가 “미국·중국 AI를 쓰기 싫은 나라에는 우리가 선택지”라며 유럽·중동을 공략하고, LG가 산업별 ‘전문가 AI’에 집중하는 배경이다. 김주호 KAIST 교수는 “한국 기업은 규모의 승부보다는 특화 영역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본과 기술을 쥔 선두주자들의 목표는 시장·규제 선점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기구로 AI를 규제하자”고 하면서도, 유럽에 가서는 “규제가 심하면 유럽에서 GPT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지난달 프랑스·스페인·영국 정상을 각각 만난 후 “AI 규제에 대해 유용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고, 오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방한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AI 생태계의 핵심은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방대한 글⋅그림⋅동영상 데이터로 훈련해, 각종 응용 AI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폐쇄형과 오픈소스, 양대 진영은 누가 AI 모델을 더 빨리 퍼트리는가를 두고 전쟁 중이다.
핵심 전선은 ‘안전’과 ‘성능’이다. 2015년 비영리기구로 출발한 오픈AI는 구글이 2017년 공개한 AI 모델(트랜스포머)에 기반해 GPT를 개발했지만, 최근 안전이 중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일리야 수츠케버 오픈AI 공동창업자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AI 모델로 누군가는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오픈소스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도 공개 강연에서 “핵무기 기술을 오픈소스로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하는 등 AI 기술 공개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진영은 ‘더 공개하는 쪽이 더 안전하며, 더 발전한다’라고 주장한다. 얀 르쿤 교수는 “인터넷의 방식처럼 AI도 모든 국가가 모든 것을 개방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AI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신경기계 번역 분야 석학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영웅 과학자 숭배주의와 인공지능 비관론이 결합된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런 논쟁 뒤에서 오픈소스 진영은 ‘저비용 고효율’의 소형 AI 모델(sLLM)로 전 세계 AI 연구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알파카’ 등은 파라미터(인간 뇌의 신경시냅스 역할을 하는 AI의 매개변수) 개수가 적음에도 특화형 AI로는 성능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픈AI에 돈 내고 챗GPT 기반 서비스를 할까’ 고려하던 스타트업 등이 오픈소스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다. 전세계 개발자 200만명이 쓰는 허깅페이스의 줄리앙 쇼몽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달 25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의 뛰어난 (개발자) 1만 명이 AI 모델 개발에 뛰어든다면, 실리콘밸리의 폐쇄형 기업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어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면, 빅테크 진영에선 “챗GPT 같은 거대 모델의 답을 모방했을 뿐”이라며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기술 업계에선 ‘오픈소스의 메기 효과’가 AI 시장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전병곤 프렌들리AI 대표(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일부 지배적 회사의 주요 모델이 있지만, 용도에 맞게 파인튜닝(조정)한 다수의 소형 모델이 있는 롱테일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 소장은 “지역별·언어별 AI 생태계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구글·애플이 양분해 30%씩 앱 수수료를 챙기는 모바일 생태계같이 되진 않을 거라는 얘기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AI가 노릴 점은 ‘크기보다 특화’라고 조언한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은 “초거대 범용 모델이 주목받지만, 혁신은 특화 모델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은 “산업 환경에 AI를 실제 적용했을 때 비즈니스 효과가 있으려면 영역별 디테일을 살린 특화 모델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 유럽 지역에 클라우드, AI, 로봇 기술을 수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네이버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간 협약식 현장. 사진 네이버
※ AI 패권 전쟁과 AI 임팩트에 관한 더 깊은 스토리는 The JoongAng Plus ‘팩플’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