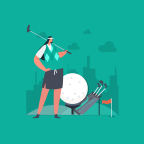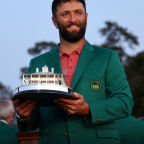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사물은 바탕이 있고 난 뒤에 색이 있으니 바탕은 색의 근본이다. 백색은 색 가운데 바탕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윤기(1741~1826)가 자신의 책 『무명자집문고(無名子集文稿)』에 남긴 문장이다.

3일 서울 강남구 경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소색비무색' 전시장에서 설영자 부관장이 전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백의를 즐겨 입었다. 삼국지, 고려사, 삼국사기 등에도 백의를 선호하는 풍습이 기록돼 있을 정도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백의는 흰색이 아니다. 염색하지 않은 모시, 삼베, 무명, 명주 등에서 비롯된 자연 그대로의 색, 소색(素色)이다.
소색의 의미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 '소색비무색(素色非無色), 흰옷에 깃든 빛깔'이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저고리, 두루마기, 갓 등 다양한 복식 자료 190여 점을 소개한다.
조효숙 경운박물관장은 "한국의 소색 의복은 옷감 본연의 빛깔과 재질이 최대한 돋보이도록 장식을 줄이고 자연의 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라며 "조선백자의 소박하고 기품 있는 모습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경운박물관이 개관 20주년 기념 전시의 테마를 '소색'으로 잡은 것은 소색이 한국적 미의 정수라는 판단에서다. 조 관장은 "소색은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한국적 미, 그 자체이면서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 등에 쓰인 민족의 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옷을 염색해 입는 것보다 소색을 입으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염색할 수 없어 소색을 입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복식사를 전공한 조 관장은 가천대 패션디자인과 석좌교수이기도 하다.

3일 서울 강남구 경운박물관에서 열린 '소색비무색' 전시장에서 조효숙 관장이 취재기자에게 전통 천연 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3일 경운박물관에 들어서자 정면에 삼베, 모시, 무명 등 천연 재료로 만든 저고리 11점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취 브로치로 여민 모시 저고리에 단속곳(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치마 바로 밑에 입던 속옷)이 비치는 모시 치마를 입은 마네킹도 있었다. 일종의 '시스루' 패션이다. 조 관장은 "옛 사진 기록을 보면 1900년대 초부터 기생이 잠자리 날개처럼 얇고 투명한 치마를 입었고 이 유행이 양반가로 번진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3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소색의 근원, 자연이 준 선물' 전시 영역에서는 칡, 대마, 견, 면 등 다양한 직물과 그 원료가 되는 누에고치, 목화솜, 삼 껍질 등을 보여준다. 꾸미지 않은 소색 그대로다. 천연에서 얻는 섬유 가운데 가장 긴 섬유인 견직물, 내구성이 좋고 세탁이 편리한 면직물 등이 전시돼 있다. 목화, 모시, 베, 명주 등 천연 섬유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어진 '우리 옷에 깃든 소색' 전시에서는 불필요한 장식을 없앤 소박한 아름다움의 한복이 시선을 끈다. 관람객들은 삼베로 만든 저고리, 옥양목(굵기가 가느다란 무명의 일종) 저고리, 호박단(광택이 있는 얇은 평직 견직물) 저고리 등을 보면서 옷감 본연의 재질을 느낄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삼베 단령(깃을 둥글게 만든 조선시대 관복)은 조선 말기 의복 간소화가 이뤄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전시 3부에 해당하는 '소색의 변주'에서는 백색과 대조되는 흑색을 다룬다. 조선 말기 성리학자 전우(1841∼1922)가 사용했던 3층 정자관 형태의 모시 쓰개가 전시돼 있는데, 검은 선을 두른 테두리가 돋보인다.

조선 말기 성리학자 전우(1841~1922)가 사용했던 3층 정자관 형태의 모시 쓰개. 테두리에 검은 선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사진 경운박물관
방문객들은 관람을 마무리하며 3D 착장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영상도 체험할 수 있다. 영상 속 가상 인간 모델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을 입고 등장한다. 고름 없이 단추로 여미는 형식의 저고리, 난초 무늬를 입힌 시스루 치마에 검은색 워커를 매치한 모델의 착장은 전통 의복이 오늘날에도 친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설영자 경운박물관 부관장은 "짧은 머리를 한 모델에 전복(긴 조끼)과 은조사로 만든 적삼 등을 입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강남구 경운박물관에서 조효숙 관장(왼쪽 네번째)과 설영자 부관장(오른쪽 세번째) 등 동문운영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경운박물관은 고등학교 동문이 모여 만든 최초의 박물관이다. 경기여고 동문들이 기증한 근대 의복 등 유물 600점을 가지고 2003년 4월 15일에 개관해 지난 20년 동안 동문들의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운영됐다. 현재 1만 2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색비무색' 전시는 12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소색을 단순한 흰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옅은 황갈색, 살구색, 상아색, 회색 등 다양한 빛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명이 가진 목화의 색, 명주가 가진 누에고치의 색 등 자연의 색이 가진 아름다움을 이번 전시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조효숙 관장)

![[오늘의 운세] 4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강남좌파, 조국당 갔다"…부자동네 표, 민주연합에 앞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e795ba60-3ccf-4eee-b4d1-91c27579509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