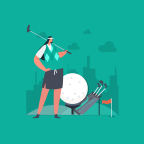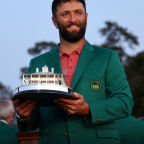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2017년 폐교된 서남대의 녹슨 안내판.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14/78f8243a-4b54-4ce4-9b32-1b28dadcba76.jpg)
2017년 폐교된 서남대의 녹슨 안내판. [중앙포토]
정원 미달된 대학 60개, 이 중 80%가 지방대
대학 정원 47만, 내년 입학 자원은 37만 불과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지방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추가모집 마감까지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경북의 한 사립대는 정시에서 6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74명에 불과했다. 이 학교는 신입생이 적어 입학식도 하지 못했다. 전북의 한 사립대도 416명 추가모집에 157명만 지원했다.
지난 1월 정시모집에서는 26개 학과(14개 대학)의 지원자가 0명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부 지방대였다. 최근 교육부 기자단이 4년제 대학 총장 111명에게 ‘10년 안에 문 닫을 대학 수’를 물었더니 ‘20~40개’(46.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40~60개’ 23.4%, ‘60개 이상’도 15.3%나 됐다.
대입 정원은 47만 명인데,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명에서 내년 37만 명으로 급감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만 19세 인구는 23만 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진학률(44%)을 적용하면 대학 신입생 수는 10만 명이다. 단적으로 지금 대학의 70~80%는 문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간 출생아가 100만 명에 달했던 1970년대생이 학생일 때는 걱정이 없었다. 1996년 대학 설립 요건 완화로 사립대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저출산의 심화로 학생이 줄자 위기가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지난 정부들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부실 대학을 선정하고도 일부만 퇴출했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연명했다.
이제는 평가 결과가 양호한 대학들도 ‘벚꽃 엔딩’의 위기에 내몰린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의 재정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연구 경쟁력을 연쇄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문 닫는 대학이 조금씩 생기다 어느 순간 대규모 미달로 ‘대학 증발’ 사태가 올 수 있다.
근본 해결책은 대입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활로를 찾고, 비리 사학은 걸러내되 문 닫는 대학이 사회복지기관·의료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특히 지방대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까지 맡고 있어 갑작스러운 폐교가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법안이 여러 번 나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사학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셈법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도 의지를 갖고 부실 대학부터 정리에 나서는 강한 실천의 결단이 필요하다.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