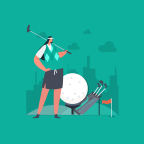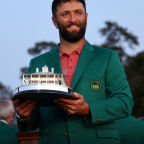전영선 K엔터팀 팀장
신문에선 한 인물을 표기할 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신문 나이’를 쓴다. ‘연 나이’라고도 한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1월 1일 떡국 한 그릇과 함께 나이를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나 태어난 월까지 고려한 ‘만 나이’와는 다르다.
왜 정확한 나이나 아예 한국 나이가 아닌 신문 나이를 쓰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추정해 보면, 출생연도를 알면 어느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지, 유명 인사라면 누구와 동기인지 등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다. 돌이켜 보면 ‘몇 년 생’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생일까지 따져 묻는 것보다는 덜 미안했다.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모두가 한 살 줄여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새삼 한국식 나이에 대한 고찰이 이어지고 있다. 정리해 보면, 그동안 총 세 종류의 나이를 써왔다. 해외에서 신기해하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복잡하긴 하다.
사실 지금도 공식 문서에서 한국 나이를 쓸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그 누구도 만 나이를 쓰지 않는다. 10대 K팝 아이돌도 자기소개할 때 대체로 한국 나이로 말한다. 해외 멤버까지 언니·오빠·막내 등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그룹의 최연장자가 리더를 맡는 건 관행이다. 해외 팬들이 한국식 나이 계산기까지 만드는 배경이다.
우리는 왜 이리 불편한 나이 관습법을 고집해 왔을까. 아마 사회에 팽배한 나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나이는 권한을 주거나 임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돼 왔다. ‘나잇값을 못한다’와 같은 표현은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너 몇 살이야” 공격을 “나이가 벼슬이냐”로 받아 싸우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뿐이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 사적 모임에선 여전히 나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 연장자는 상석에 앉고, 막내는 수저를 세팅한다.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내년 1월 1일에도 ‘한 살 더 먹었다’는 한탄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나이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는 되는 것 같다. 우선 나부터 나이 좀 그만 캐물어야겠다.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