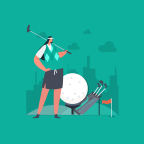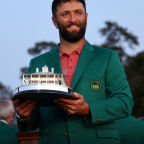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식당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08/6a8b7351-1b51-4231-bb35-233a9036f429.jpg)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식당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당원은 투표율이 높고 젊을 확률도 높다.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주호영 후보가 조직을 많이 모았다. 극단적인 (차이였지만) 당원 투표에서 거의 (제가) 안 밀렸다."
이준석 돌풍은 곧 정권교체 열망 #교체론에 기대 욕심 부려선 안돼 #리스크 줄이고 차분히 역할해야
지난달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이란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는다"며 한 말이다. 선거 결과 발표 일주일쯤 전이었던 당시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사활을 걸고 전면전을 치르고 있을 때다. 일반 여론조사에선 '바람'의 홍 의원이 앞섰지만, 당심에선 '조직'의 윤 후보가 나을 거란 예측으로 기세가 팽팽했다. 윤 후보로선 온라인 당원을 비롯한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예민한 시국에 대표가 당심을 꺼내들며 “온라인 당원에 젊은층이 많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할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홍 의원이 2030세대의 지지가 높다는 건 공공연한 상식이 아니었던가.
사실 윤석열-이준석의 케미는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이 대표가 윤 전 검찰총장이 후보가 되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돌아다녔고, 그 와중에 '오세훈 차출론' 등 지나친 언행이 이어지며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윤 후보 역시 이 대표가 서울에 없는 사이 감행한 '기습 입당'과 '봉사활동 보이콧' 등으로 감정의 골을 깊게 했다. 경선 기간 중에도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실언할 때마다 따박따박 한마디씩 했다. '개 사진' 논란엔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고,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선 "정치인은 고민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캠프의 한 인사는 "당이 노골적으로 다른 후보를 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시대다. 대표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당은 윤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겠지만 대표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한다. 윤 후보로선 2030 지지율이 낮으니 젊은 이 대표가 더 절실할 수도 있겠다. 이 대표 자신도 SNS와 유튜브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광체라 뒤로 물러나 있을 스타일도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윤 후보가 입당 초기와 달리 이 대표에 대해 신중해졌다는 점이다. 경선 기간(지난 1일)엔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고 했고, 당선 후엔 가장 먼저(6일) 오찬 회동도 했다. 거기서도 윤 후보가 어떻게든 이 대표를 보듬겠다는 분위기가 읽혔다.
이 대표는 과연 대선 국면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여전히 걱정스럽다. 경선 기간 '이슈 오도독'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대표의 불공정이 다른 형태의 리스크로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믿음이 강하고 다변이다 보니 늘 사달이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한다. 엄중한 대선 레이스에선 취약한 구조다. 이미 나타난 '이준석 리스크'의 조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극한 감정적 대립이다. "정상적 출마가 아니다"는 등 연일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에선 대선을 치를 당의 대표가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5%도 나오지 않은 김종필 전 총리에게 내각의 절반을 내주며 연합한 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랬던 걸까.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였다. DJ는 결국 1.6%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정권교체론이 57%에 달하지만 야당 후보 지지율이 그에 못 미치는 건 이번 선거가 야당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정권교체론이 높다고 지난 재·보궐 승리처럼 될 것이라 여긴다면 그건 이미 패한 거다. 교체론에 기대어 제 욕심을 부려볼 생각을 해도 낭패다. 이 대표는 왜 자신이 대표가 됐는지를 다시 새겨야 한다. '이준석 돌풍'은 스타 발굴이 아니라 목마른 보수의 정권교체 열망이었다. 자기정치보다 정권교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 대표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신용호 정치에디터

![[오늘의 운세] 4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강남좌파, 조국당 갔다"…부자동네 표, 민주연합에 앞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e795ba60-3ccf-4eee-b4d1-91c27579509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