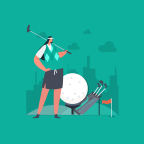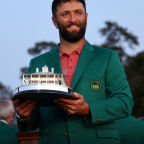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를 펴낸 간호사 전지은 씨. 우상조 기자
40여년간 만난 중환자만 5만여명. 대부분은 삶의 끝자락에 있었다. 미국 간호사 전지은(65) 씨는 2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 “늘 죽음을 만나는 사람”이었다. 수십 년 전의 사연도 떠올릴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걸 보면 아무리 자주 맞닥뜨려도 익숙해지지는 않는 게 죽음인 모양이다. 그때그때 메모로 남겼던 “명치 끝을 달막달막하게 하는 아픔들, 기억의 꼬리를 잡고 있는 이야기”를 모아 최근 에세이집을 펴낸 전씨를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상암동 사옥에서 만났다.
“옥자 아주머니” 소리에 기적처럼 눈 뜬 한인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한 어르신이 6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의 수술과 치료를 고집하다가 끝내 “내 욕심이었나보다”라고 연명 치료 중단에 동의하면서 읊조리던 말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옮겼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박힌다는 전 씨는 “그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도 저렇게 애절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라면서 눈가를 훔쳤다.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난 당신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긴 공군사관생도와 그 뜻을 따라 의연하게 10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가족은 전씨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다.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들어왔다가 “옥자 아주머니” 소리에 기적처럼 눈을 떴던 ‘옥자 스미스’ 씨. 뭘 도와드리면 되겠냐는 전 씨에게 “흰 죽 좀 쒀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던 그는 전씨의 설득에도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한국의 가족을 끝내 찾지 않고 하늘로 갔다. 전 남편에게 두고 온 세 살배기였던 아들과의 재회도 포기했다. 이후 옥자씨의 남편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연락처를 발견했고, 전씨로부터 뒤늦게 누나의 소식을 들은 남동생은 한참을 소리 내 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는 길이 고통스럽진 않았나요.” 펜로즈 병원의 한인 최초 케이스 매니저(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특별간호사)이자 통역사로 일하며 겪었던 일이다.

전지은 씨가 1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인희 시인의 딸이다. 우상조 기자
전 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건 28살 때다. 남편의 유학길에 아들과 함께 따라나선 전 씨는 2년 만에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종합병원과 네바다 주립대를 다니면서 4년간 주경야독 생활을 했다. 중환자실 근무를 자처한 건 이때였다. 소속 병동 없이 필요한 곳마다 근무를 서는 플롯 풀(float pool) 생활을 할 때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5분마다 환자를 체크하는 일종의 강박감이 있었다”며 “중환자실에선 모니터에 환자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했다”고 했다. 그렇게 자원한 중환자실을 지킨 세월이 34년이다.
10년간 한글 완전히 끊었던 문예소녀
![20년 전쯤 산타크루즈의 도미니칸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모습. 당시 우수간호사로 선발돼 병원 사보에 실린 사진이다. [전지은 씨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03/858c96e9-1153-4438-ad5f-c8053297b513.jpg)
20년 전쯤 산타크루즈의 도미니칸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모습. 당시 우수간호사로 선발돼 병원 사보에 실린 사진이다. [전지은 씨 제공]
카세트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영어 공부를 하고 왔지만,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 언어의 장벽은 높았다. 10년 넘게 한국말을 완전히 끊고 중환자실의 모든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최고 등급 간호사 레벨4까지 올랐다. 다시 한글을 찾은 건 자궁근종 수술 때문이었다.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그에게 병원이 2주 보너스 휴가를 주면서 두 달간 쉬게 되면서다. 한국어책 수십권을 주문해 읽고, 미주한국일보 생활수기에 응모해 당선됐다. 학창시절 엄마 몰래 밤새 책을 쌓아두고 읽던 문예소녀는 그렇게 다시 펜을 들었다. 국문과에 낙방하는 바람에 어쩌다 간호사가 됐지만, 그 덕분에 다시 글을 쓰게 된 셈이다. 그런 그를 보며 주변에선 “피는 못 속인다”고들 한다. 그가 두 살 때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동해 최인희 문학상’의 시인 최인희(1926~1958)다.
숱한 죽음을 겪었지만, 전씨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정작 은퇴 후였다. 초등학교 교사로 전씨를 홀로 키운 어머니를 지난해 요양원에 모시면서다. 무남독녀 외동딸의 미국 행을 끝까지 반대하던, 공부 마치면 꼭 돌아오겠다는 딸 부부에게 20년간 새해마다 “올해도 안 오니?”라고 묻던 어머니다. 한국에 들어와 4개월간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그는 “직접 모시지 못하고 불효하는 것 같아서” 매일 울었다. 전씨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엄마가 살아계시는 것”이라며 “엄마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전지은 씨는 "(죽은 후의)나를 나눔으로써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1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우상조 기자
사실 전씨는 오래전 죽음을 준비해뒀다. 20여년 전 남편과 함께 ‘리빙 윌’(생전유서)을 썼다. ‘(의식을 잃고) 일주일이 지나도 좋아질 기미가 없으면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는 내용이다. 죽은 후엔 화장해서 태평양에 보내달라고도 썼다. “태평양이 동해와 가장 가까우니 죽어선 고향 강릉에 가겠다”는 뜻이다. ‘모든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뜻도 담았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장기기증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장기기증)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할 순 없다”면서도 “(죽은 후의)나를 나눔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고 했다.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