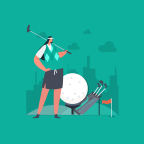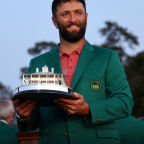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전력난으로 중국 남부 광둥성 제조업 거점인 둥관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 불이 꺼진 모습. [AFP=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02/a160be0e-90ef-4fd5-b9ea-8afb75447435.jpg)
전력난으로 중국 남부 광둥성 제조업 거점인 둥관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 불이 꺼진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이 그야말로 '깜깜'하다. 정전으로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호소가 빗발친다.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 연속 전력부족 경보가 발령된 랴오닝성의 한 공장에선 정전에 따른 환풍기 가동 중단으로 노동자 2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전력난으로 애플과 테슬라의 핵심 부품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다. 상점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하느라 양초 판매가 때아닌 호황이다.
세계 최대 전기 소비국인 중국이 전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발전용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간 버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중국 내 주요 발전소 6곳의 석탄 비축량이 1131만t에 불과하며 이는 15일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극심한 전력난 탓에 중국 31개 지역 중에서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광둥성 등 20개 지역에서 전력 공급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한정(韓正) 부총리가 이번주 초 에너지기업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가 운영에 충분한 연료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제 성장과 함께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려온 중국이지만 최근의 전력난은 여러 요인이 겹쳤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실질 탄소 배출량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다 석탄·천연가스 등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가격 상승이 맞물렸다. 무엇보다 호주와의 석탄 전쟁이 결정타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6일 중국이 호주와 경제·외교적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면서 석탄 부족이 전력난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는데, 이로 인한 산업단지의 필요 전력량을 중국이 못 맞추고 있다면서다.
![중국 전력원 비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국전력기업연합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02/a61b75ce-5010-4928-826f-93ffbfcf0333.jpg)
중국 전력원 비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국전력기업연합회]
중국은 세계적인 탈화석연료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아직도 주된 전력원은 석탄·석유 등 화력발전이다. 중국 전력기업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저탄소 정책을 표방하니 현장에선 석탄 생산량을 마구 늘리긴 어렵고, 호주로부터 수입 물량까지 줄면서 급증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단 얘기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해마다 약 3억t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호주와 갈등을 빚던 끝에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해 4월 미국·독일·프랑스 정상에게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분노한 중국은 지난해 5월 호주산 소고기 수입규제를 시작으로 바닷가재, 와인, 석탄, 보리, 목재, 구리 등을 잇달아 수입금지 품목으로 확대하며 '무역 압박'에 나섰다. 호주는 장관급 공식회담을 제안하는 등 건설적 협력을 모색했지만, 접점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석탄 수출 물량의 주요 판로가 막히면서 호주 무역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의 갈등은 문화·외교 등으로도 확대됐다.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기 지역(in danger)'으로 지정하는 문제에서 세계유산위원회(WHC) 의장국인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백신을 후원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가 정치적으로 백신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호주와 중국 국기의 모슴. [AFP=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02/e55a210c-5f83-4078-ac7d-78e98fa4f20a.jpg)
호주와 중국 국기의 모슴. [AFP=연합뉴스]
호주는 무역 전쟁 초기에 수세에 몰리는 듯했지만, 중국을 집요하게 치받으며 '되치기'를 시도했다. 지난 3월 중국에 대한 건초 수출을 금지했고, 지난 4월에는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와 중국 정부 사이에 진행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무산시켰다. 또한 호주산 와인과 보리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심지어 석탄전쟁마저도 호주가 승기를 잡았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최근 한 국립대학 포럼에서 "올 6월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 달러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다른 나라로 수출이 44억 달러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란 인도, 한국, 대만 등으로 호주는 과거 중국에 목매던 석탄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성공한 분위기다.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안보 강화'로도 이어진 모양새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엔 미국·영국과 함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도 발족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호주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건조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한껏 높였다.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밀리지 않은 호주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전 세계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철광석 생산 경쟁국인 남미와 인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죽을 쑤는 덕분에 독보적인 철광석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철 생산국인 중국으로선 호주가 행여나 철광석 수출 중단이라도 할까 봐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중국은 철 생산의 원료인 철광석을 80%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량의 60%가 호주에서 온다.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