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형 실업부조제(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 위협을 덜어주면서 고용 알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선진국엔 보편화한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준다.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도 최대 265만원 지원한다. 취약계층에겐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은 그림의 떡이다. 생계에 쫓겨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에도 벅차서다. 이들에게 실업부조제는 단비 같은 제도다. 기본소득 같은 효과를 낸다.
내년 닻 올리는 국민취업지원제 #정부가 규제로 틀어쥔 직업훈련 #실적 부풀리기식 직업알선 체계 #둘 다 혁신 않으면 말짱 도루묵
잘만 작동하면 고용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실업부조제의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업부조제는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친고용정책’의 완결판으로 불린다. 이 속성을 구현하려면 선결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선진화된 직업훈련과 촘촘하고 적확한 고용서비스(취업 알선 등) 체계다. 적성에 맞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는 실업부조제라는 엔진에 연결된 구동장치인 셈이다.
한데 이 구동장치가 엉망이다. 고용서비스는 취업 알선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 직업훈련은 1970~80년대 시스템에서 못 벗어났다. 이대로면 엔진에 기름만 부어 낭비하기에 십상이다. 자칫하면 돈만 살포하는 포퓰리즘 내지는 예산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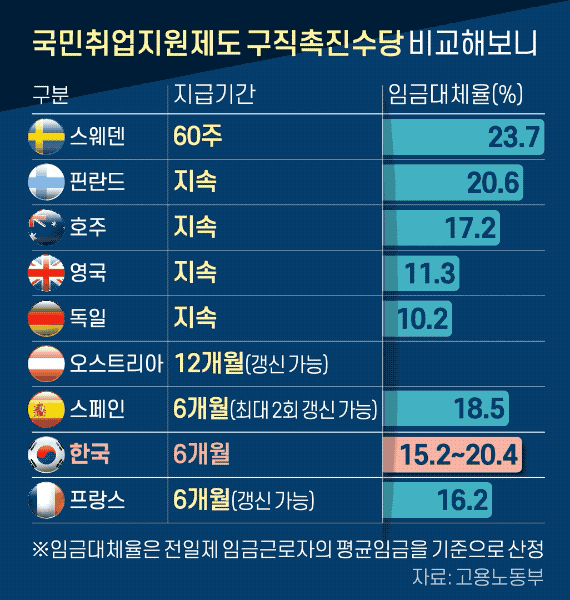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비교해보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 조짐은 벌써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알리며 돈 주는 것만 강조하는 듯했다.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돈 지급 시기 등이 주요 브리핑 내용이었다. 목표를 상실하고, 제도의 취지가 오염된 인상이다. 구동장치를 돌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방증이자 포퓰리즘으로 부조제에 접근한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직업훈련은 구직의 첫 단추다.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직업훈련 체계를 손봤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 늘 겉돌았다. 직업훈련의 골격을 ‘규제’에 뒀기 때문이다. 훈련시간, 단가, 교사, 정원, 반 구성, 시설·장비 등 미세한 사안까지 모조리 정부가 틀어쥐고 간섭하는 체계다. 직업훈련이 철저히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직업훈련 시장=정부 관할’이라는 도식이 작동한다.
예컨대 미용 분야 훈련 단가는 시간당 6468원이다. 최저임금(8590원)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책정한 이 금액은 수년째 그대로다.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이 돈으로 어떻게 실습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러니 제대로 된 훈련 대신 시간 때우기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직자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직업훈련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은 2조2709억원이다. 실업부조제가 시행되지 않은 올해 예산(2조2434억원)과 별 차이가 없다.

OECD는 스스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데 돈 쓰고, 한국은 정부가 돈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체형 직업 훈련이 힘들게 되자 정부는 전문학교 등 각 기관에 온라인 강의를 독려했다. 정부가 주는 훈련비가 끊기면 문을 닫아야 하는 훈련기관 입장에선 정부의 말이 곧 법이다. 그러나 수시로 내려오는 이런 주문에 분통을 터뜨린다. 현실과 동떨어져서다. 서울의 모 물류 훈련 기관 관계자는 “물류 업무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강의하나. 그런 강의를 들은 구직자가 실제 취업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나. 비대면만 되뇔 게 아니라 훈련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훈련시장을 틀어쥔 상황에선 훈련기관의 자율성이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훈련 내용 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 훈련기관도 정부가 주는 훈련비만 받으면 되니 경쟁력 강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구직자 입장에선 받고 싶은 훈련이 있어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못 찾는다. 실업부조 지원금만 쓰고 능력은 배양하기 힘든, 말짱 도루묵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일자리 알선 서비스도 낙후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올해 초 고용서비스 실태를 반성했다. 내용은 이랬다.
‘지금 체계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종합고용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고용센터를 만들고,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연계와 협업이 안 된다. 일부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보다 어떤 일자리든 많이 취업시키면 성과가 높게 나오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했다.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 허위로 취업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까지 나오는 판이다. 기업 정보 관리와 공유가 안 돼 어느 기업에서 어떤 구직자를 원하는지 모르는 지경이다.’
한마디로 공공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선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자 중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18.6%에 그쳤다. 대부분 본인이 발로 뛰어 취업(81.4%)했다.
특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은 심각하다. 전문 교육기관이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없다. 2018년 기준으로 교육받은 종사자는 23%에 불과할 정도다. 이러니 고용센터가 알선하는 일자리가 환경미화나 건설, 경비, 단순 생산직에 몰릴 수밖에 없다.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분야다. 정보통신과 같은 능력 맞춤형 일자리 알선 실적은 10% 안팎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2f771d18-42c5-436f-8494-68e4fd1e2fa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