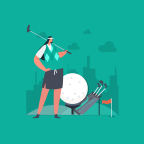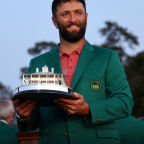신준봉 전문기자의 이번 주 이 책

인간 무리
인간 무리
마크 모펫 지음
김성훈 옮김
김영사
‘익명 사회’가 평화에 도움 #배타적인 동물 세계와 달라 #인류학·역사학 등 버무려 #하버드 출신 생물학자 연구
카페 안에 낯선 사람이 가득해도 우리는 별걱정 없이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커피값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 심한 경우 내게 커피를 건네는 바리스타는 카페인 공급 기계일 뿐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긴장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정은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일 텐데 커피를 사는 나는 가련한 카페인 중독자쯤 되지 않을까. 피차 상대방을 의미 있는 혹은 위협적인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상에 인간 진화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동물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침팬지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어쩌다 낯선 무리 속에 뛰어들게 된 무지한 침팬지가 무사히 돌아 나오는 일 같은 건 없다는 것이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곤충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가령 수십억 마리 규모로 초군집을 이루고 사는 아르헨티나개미 사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초군집들 사이 경계선을 넘은 개미는 십중팔구 시체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초군집들은 영역이 뒤섞이는 순간 격렬한 전투를 벌인다. 캘리포니아의 한 아르헨티나개미 전장에서는 매달 100만 마리가 죽어 나간다. 저자는 쓴다. 인간들의 1차 대전 서부전선이 따로 없다고.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제국주의적인 생명체인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전시(戰時)를 제외하면 인간은 개미나 침팬지와 다르다. 대체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사회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다. 가령 개미나 침팬지뿐 아니라 소설 『모비 딕』에서 바다 괴물로 그려진 향유고래는 코다(coda)라는 “짧은 딸깍 소리”로 서로를 식별하며 6~24마리가 단위사회를 이루는데 수백 개의 단위사회가 한 무리를 구성하고, 이런 다섯 무리가 태평양 전역에 퍼져 있다.
인간은 과연 어떻게 동물과 비슷하면서도 판이하게 진화해온 걸까. 낯선 카페에서 무사히 커피 마시기 말이다. 어떻게 낯선 개체를 데면데면 예사롭게 대하게 됐나. 인지 능력이 뛰어나 안전 여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특유의 공동체 정신 발달 때문에?
![침팬지 무리는 낯선 개체를 만나면 가만 두지 않는다. 그만큼 배타적이다. 타자와도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인간과 다른 점이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008/22/add50527-34a3-4c5b-8521-ce0cd057c746.jpg)
침팬지 무리는 낯선 개체를 만나면 가만 두지 않는다. 그만큼 배타적이다. 타자와도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인간과 다른 점이다. [중앙포토]
저자 마크 모펫은 곤충 전문가다. 스스로 개미 생물학자로 소개한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나(한국에서는 보통 아픈 과거로 치부한다) 하버드에서 진화생물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신의 전공 지식에 사회학·역사학·철학·인류학·심리학 등 이질적인 학문도 마다치 않고 관련 지식을 끌어모아 한국판 부제처럼 인간은 왜 무리 지어 사는지, 또 어떻게 무리 지어 살 수 있었는지를 방대하게 추적했다. 영어 원서가 480쪽, 두툼한 주(註)·참고문헌·색인을 붙인 한국판은 740쪽이나 된다.
그런 질문에 가장 단순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면 사람만이 갖춘 적당한 익명성이다. 수십 마리 규모의 원숭이 사회에서는 모든 개체가 서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안 싸운다. 익명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개미 초군집은 반대다. 아무도 몰라도 된다. 몸에서 분비하는 페로몬의 탄화수소 조합만 일치하면 동료로 식별한다. 인간은 중간이다. 몇 명하고만 친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안전한 익명’이라는 점만 확신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치부하고 어울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 가르기가 작동한다는 점이 인간의 문제다. 그 극단적인 결과가 세계 대전 혹은 요즘 유난한 각종 차별일 것이다. 책은 그 해법 혹은 지구상의 영구 평화가 올 가능성까지 건드린다.
인간이 어떻게, 왜 지금과 같은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은 인류가 어떻게 현재의 문명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겹친다. 그동안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숱하게 되풀이돼온 연구주제일 게다. 주로 생물학과 인류학을 버무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선지 책에서는 추정과 가설이 적지 않다. 인간 사회 현상의 원리를 동물의 세계에서 찾는 심심한 논리로 흐르는 대목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신념은 확고한 것 같다. 역사학자는 국가의 탄생을 지나치게 근래의 현상으로 보고,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는 사회를 선택의 문제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생물학에 뿌리가 닿아 있는, 오래되고 불가피한 삶의 형식이 사회고 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책은 이야기책처럼 잘 읽힌다. 치과의사를 그만두고 번역가로 나선 김성훈씨의 문장이 매끄럽다.
신준봉 전문기자 inform@joongang.co.kr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