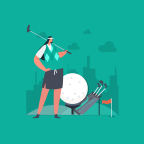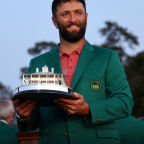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더,오래] 김명희의 내가 본 희망과 절망(35)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 거대한 구멍은 최상층인 1층에서 점점 지하로 내려갈수록 330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가 볼 땐 지구의 축소판이었다. 그 안에 층층이 갇힌 사람들. 창문도 없고 탈출구도 없다. 그곳엔 날아다니는 교자상이 있다. 그 거대한 식탁에 매일 최고급 식사가 차려져 하루 세 번 아래로 아래로 이동한다. 1층에서 먹고 남은 음식상이 2층으로 내려가고, 2층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상이 다시 3층으로, 이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다.
대략 50여 층까지 내려가면, 상 위에 먹을 것이라곤 한 톨도 없다. 빈 그릇과 생선 뼈나 동물 뼈만 덩그러니 남은 상이 끝없이 각층에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간다.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잡아먹고, 룸메이트에게 잡아먹힐까봐 편히 잠도 못 자고 서로를 경계하며 뜬눈으로 새운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랜덤으로 새로운 층으로 이동한다. 어느 층으로 이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경우는 운이 좋아 상층으로 이동하고 어떤 경우는 맨 하층으로 이동해서 스스로 자기 몸의 살을 조금씩 잘라 먹으며 비명을 지른다.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이루어진 세상.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잡아먹고, 룸메이트에게 잡아먹힐까 봐 잠도 못 자고 서로를 경계하며 뜬눈으로 새운다. [사진 영화 '더 플랫폼' 스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0/b576972f-c014-4340-92dc-4f63cac8aacc.jpg)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이루어진 세상.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잡아먹고, 룸메이트에게 잡아먹힐까 봐 잠도 못 자고 서로를 경계하며 뜬눈으로 새운다. [사진 영화 '더 플랫폼' 스틸]
만약 그들이 아래층 사람을 생각해 음식을 적당히 절제하면서 먹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인간은 1층으로 올라갈수록, 맨 아래층에서 굶주리고 인육을 먹었던 비극을 쉽게 잊고 식탐을 채우는 데 열중한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먹고 남은 음식상이 엘리베이터처럼 다음 층으로 수직하강 할 때 상 위에 남은 음식물에 침을 뱉기도 한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 음식을 먹지 않을 방법이 없다. 살기 위해선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인간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가장 지하층에서 지옥의 짐승처럼 어슬렁거린다.
주인공과 몇 사람은 결국 자신들이 또 언제 굶주림에 허덕일 지하층으로 이동될지 몰라 최대한 아래층까지 음식을 보존하며 내려보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결국 수직으로 이동하는 교자상 위에 몽둥이를 들고 올라탄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각 층의 인간에게, 음식을 최대한 소량씩만 먹고 아래로 내려보내 많은 이들이 생존하게 하자고 권유와 협박을 한다. 식탁 위의 접시에 마지막 두 사람 몫을 최후까지 남겨 계속 아래로 내려보내려 노력한다. 그들은 처음엔 그 룰이 지켜지지 않고 서로 죽이며 갈등을 겪지만, 결국 언제 자신도 또 그 지하층으로 떨어져 인육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지구는 곧 식량이 바닥날, 극히 한정된 음식상과 같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모든 자원을 다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낭비하면, 아래층에 있는 후대의 인간들은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사진 pexels]](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0/9603939f-234a-4456-b07c-e68623b8bf5d.jpg)
지구는 곧 식량이 바닥날, 극히 한정된 음식상과 같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모든 자원을 다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낭비하면, 아래층에 있는 후대의 인간들은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사진 pexels]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떠올랐다. 지구는 곧 식량이 바닥날, 극히 한정된 음식상과 같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모든 자원을 다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낭비하고 환경을 망가트리면, 아래층에 있는 후대의 인간은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사용할 자원이 없다. 결국 영화 속 그들처럼 굶주림에 죽어가든지, 서로를 죽여서 살을 뜯어 먹으며 버티든지, 그럴 용기가 없다면 자신의 살을 조금씩 잘라 먹고 약을 발라놓고 새살이 돋고 다시 잘라 먹고 연명하다 결국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배가 불러 불편할 정도로 과식하지 말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조금씩 덜 먹고 남겨서 내려보내자고. 그들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두 함께 협조하면 승산이 있다고 희망을 말한다. 결국 그들은 해낸다.
요즘 지구환경 캠페인이 뜨겁다. 그러나 결실은 생각만큼 눈에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얼마 전 나도 문인들 사이에서 릴레이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바통을 받고 이어간 적이 있다. 그때 썼던 시 한 편을 나누며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 작은 접시와 같은 이 지구에 남은 음식을 우리 함께 아껴보면 어떨까. 혼자는 힘들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미드웨이 섬의 비극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외치며-
김명희
비극은 섬 바깥, 무관심이 버린 쓰레기에서 시작되었다
섬으로 떠밀려온 폐기물들은 독버섯처럼 화려했다
노래가 사라진 해변에서 폭탄 같은 주검들이 출몰했고
날마다 섬 안으로 불길한 흉기들이 떠내려왔다
형광빛 폐기물들이 바다에 반짝일 때마다
날개들은 절벽을 딛고 신화처럼 날아올랐고
흉기들은 새들의 한 끼 식사로 돌변하곤 했다
죽음들은 둥근 해안선에 핀 해당화보다 성장이 빨랐고
새들의 족보는 멸종을 향해 날마다 부패를 서둘렀다
저녁이 되자, 새들의 슬픈 장지(葬地)가 된 섬에서
또 한 무리의 날개들이 허공을 놓친 채 모래사장으로 추락했다
긴 슬픔을 조문하던 바람은 밤새 비를 뿌렸고
새와 물고기 떼의 동공에서 죽음보다 붉은 핏빛 절규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에도 곳곳에서 편리함과 위생을 핑계로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젠 정말 멈춰야 한다.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좋겠다. 물론 나도 실천하려 노력 중이다.
시인·소설가 theore_creator@joongang.co.kr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