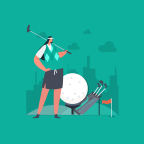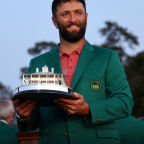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됐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3/09/40a4073b-061a-46a6-9eaf-b83eaa77b7ce.jpg)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됐다. [연합뉴스]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니 참 난처하네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거센 반발 #"택시만 유리", 정부와 택시 불신 탓 #플랫폼 운송사업 자리 잡을 토대 절실 #"총량제, 기여금 등 과감한 유연성 필요" # 택시업계의 반발 극복이 정부 과제 # "택시도 자기혁신 없인 공감 못 받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는 당혹한 표정이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 국토부 기자실을 이례적으로 찾아 법률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모빌리티활성화법"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거센 비판에 다소 억울한 표정이기도 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최근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한 법원 1심 판결로 인해 누구나 자본만 있으면 택시 면허 없이도 렌터카(승합차)를 이용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예상되는 혼란을 법률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막았다는 판단일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플랫폼 사업 분야의 신설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선뜻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스타트업에게 활짝 문을 열어줬다는 자평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업계의 충돌은 비단 우리 만의 일은 아니다. 세계적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만 봐도 미국을 제외하곤 자신들이 진출한 나라의 상당수에서 택시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지역은 물론 멕시코,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 베를린의 택시 유리창에 우버 퇴출을 요구하는 푯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3/09/6410fd66-2cfc-4e34-a278-e4f7807ab451.jpg)
독일 베를린의 택시 유리창에 우버 퇴출을 요구하는 푯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유럽에서는 또 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우버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 각종 복지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판결이 이어져 우버가 항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적인 제재도 곳곳에서 가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게 있다. 1년 6개월 뒤면 타다가 현행 방식으로는 불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근본 원인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세계적 흐름인 '승차 공유'를 왜 우리만 막냐는 반감보다는 타다 마저 없어지면 저 불친절한 택시를 다시 타야만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더 큰 것 같다"고 진단한다. 불친절, 승차거부, 찌든 담배 냄새로 대표되는 우리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켜켜이 쌓인 불만이 반작용으로 타다에 대한 옹호와 환호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많다.
또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신설했다고 해도 "타다같은 서비스가 제대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불안감 역시 한몫하고 있다.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택시업계에만 유리하게 방향이 잡힐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 바탕에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결국 정부 주장대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오해라면 정부가 그걸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타다가 지금까지 택시 운송 시장에서 했던 그 활기찬 '메기' 역할을 넘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여객운송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무엇보다 택시 총량제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25만대인 전국의 택시 숫자 안에서 감차 사업들 통해 확보되는 택시면허만큼 플랫폼 운송사업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해 감차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몇백대 수준으로는 여러 스타트업이 제대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시의적절한 증차 등 제대로 사업계획을 짜기도 힘들다.
그래서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최소한 한해 어느 정도의 면허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여기에 밀려서 기존 택시 총량제의 고정된 틀 속에 다시 갇혀 버린다면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법을 개정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타다는 1년 6개월 뒤면 현행 방식대로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3/09/00aa3085-865f-4251-9b98-a5b759db4246.jpg)
타다는 1년 6개월 뒤면 현행 방식대로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스타트업이 플랫폼 운송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내야 할 기여금 역시 마찬가지다. 기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이디어는 좋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여금은 택시 감차사업에 일부 보탬이 되는 수준이 되어야지 스타트업이 내는 기여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마도 기여금 산정 과정에서도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이겨내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이 같은 사안들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작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지금 나오는 비판처럼 '타다 금지법=택시 보호법'이라는 프레임을 결코 깨지 못한다. 택시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의 등장에 맞춰 택시업계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택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한다면 국민적 반발만 살 뿐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택시업계에 가해지던 요금, 부제, 차량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조치 역시 동반돼야 한다.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성패는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렸다. 그 역할에 따라 국민이 얼마나 편안한 운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느냐가 좌우된다. 개정안 통과에 안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