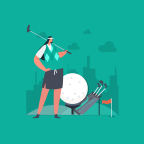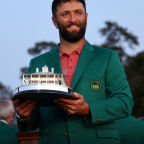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2013년 제주시 애월읍 고내 포구에서 열린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식 현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축제 참가자들과 신나게 놀고 있다.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선 흔한 풍경이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4/da22a31c-a1f1-4432-95ca-b296e2fee241.jpg)
2013년 제주시 애월읍 고내 포구에서 열린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식 현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축제 참가자들과 신나게 놀고 있다.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선 흔한 풍경이다. [중앙포토]
장면 1
“걷기축제를 하겠다고요? 걷기가 축제가 된다고요? 축제는 풍물놀이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걷기는 대회 같은 걸 하는 거고요.”
- 2010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올레길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예산 지원을 문의하자.
장면 2
“제10회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오신 올레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2019년 10월 30일 서귀포 약천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을 대표하여 개막식 축사에서.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청 공무원한테 핀잔이나 들었던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어쩌다 도지사가 나와 인사를 하는 행사가 됐을까. 아니 올레 축제가 10년째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올레길을 걷겠다고 제주도까지 내려오는 이 수천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
제주올레 걷기축제 10년을 지켜봤다. 해마다 가을이면 기적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수천 명이 올레길을 걷는 풍경은 제주도의 어떤 명승보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럼에도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애초의 걷기여행과 본래의 축제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제주올레 걷기축제 10년을 돌아봤다. 먼저 소감부터 말한다. 함께 걸어서 영광이었다.
걷기, 놀이가 되다

2010년 제1회 제주올레 걷기축제 첫날. 1코스 말미오름 정상에서 당근밭 사이를 걷는 올레꾼을 촬영했다. 신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진이다. 손민호 기자
제주올레 걷기축제는 2010년 개막했다.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린다. 제주올레가 2007년 1코스를 열었으니까, 코스 개장 3년째 되는 해 축제가 시작됐다. 축제는 한 번에 2∼5개 코스에서 진행됐다. 하루에 1코스씩 걷는 방식이다. 2015년까지 26개 코스를 다 돌고, 2016년 1코스부터 다시 걷고 있다.
축제 참가자는 하루 평균 4000명, 매년 연인원 1만 명 안팎으로 집계된다. 외국인도 매년 1000명꼴로 참가하고 있다. 국적은 일본·중국·스위스·미국·스페인 등 얼추 30개국에 이른다.

㈔제주올레가 올해 축제 참가자 544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참가자의 84.9%가 육지에서 온 관광객이다. 송가인·장윤정 등 초대가수 공연이 메인 이벤트인 지역의 여느 축제와 달리 외지인의 참가율이 매우 높다.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관광축제라는 뜻이다.

019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식날. 축제가 열리면 올레꾼은 코스튬 플레이를 한다. 올레꾼 스스로 축제의 볼거리가 된다. 손민호 기자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다. 애초의 걷기여행은 순례에서 비롯됐다. 인내하고 회개하는 종교적 제의에 가까웠다. 한국 사회에서 걷기여행은 힐링 열풍과 함께 퍼져나갔다. 도시 생활에 찌든 현대인이 자연 속을 걸으며 위안을 얻고 치유를 경험했다. 올레 열풍 초기, 올레길에선 혼자 걷는 여성이, 혼자 울면서 걷는 여성이 자주 띄었다.
그러나 걷기축제는 다르다. 축제의 본질은 흥겨움이고 어울림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취하는 신명의 한마당이다. 고행을 감내해야 하는 걷기와 쾌(快)를 외치는 축제는 차원이 다른 레저활동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노경국 관광정책관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그는 2011년 최초로 제주올레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관광학자다.
“걷기가 축제가 됐다는 건 걷기가 유희의 대상, 즉 놀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20㎞씩 걸어도 여럿이 같이하면 재미있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올레 축제가 정착함으로써 걷기여행은 다음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올레라는 컬트
![2019년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서. 올레 축제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사진 제주올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4/dc60f9d5-0104-4d18-944a-7aba4a4a50a9.jpg)
2019년 제주올레 걷기축제에서. 올레 축제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사진 제주올레]
제주올레 걷기축제는 왜 재미있을까. 일단 볼거리가 풍부하다. 문화예술인이 올레길 곳곳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한다. 코스 하나에 보통 공연 네댓 개가 배치된다.
2011년 6코스를 걸을 때였다. 폭우가 내리던 날 제지기오름을 올랐다. 오름 분화구에 다다르니 흠뻑 젖은 여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흠뻑 젖은 올레꾼들이 길을 걷다 말고 공연을 지켜봤다. 출발점에선 초등학생들이 동요를 합창하고, 바닷가에선 해녀 할망들이 해녀 춤을 춘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 7명이 결성한 ‘칠선녀 댄스팀’은 2013년부터 올레 축제를 뜨겁게 달군 인기 스타다.
㈔제주올레 직원들이 처음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건 2011년이었다. 이후 눈에 띄는 복장과 분장은 올레 축제의 주요 코드가 됐다. 올해 미키마우스 복장을 하고 사흘 내내 축제를 즐긴 올레꾼은 놀랍게도 일본인이다.
![올레 축제가 열리면 마을 부녀회가 올레꾼을 위해 점심을 차린다. 점심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모두 마을에 돌아간다. 사진은 2013년 축제 때 설겆이를 하는 지역 주민[사진 제주올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4/89830bd6-a899-4e56-8c78-61cc8f166e9d.jpg)
올레 축제가 열리면 마을 부녀회가 올레꾼을 위해 점심을 차린다. 점심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모두 마을에 돌아간다. 사진은 2013년 축제 때 설겆이를 하는 지역 주민[사진 제주올레]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 활발하다. 이를테면 점심은 마을 부녀회가 차린다. 선착순 1000명에게 손수 만든 국수·비빔밥 등을 8000원에 판다. 수익은 모두 마을에 돌아간다. 코스마다 마을 특산물 부스와 지역 기업 부스 여남은 개가 들어서고, 길목마다 평균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올레꾼을 안내한다. 제주관광공사 고선영 연구조사센터장은 “올레 축제는 지역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올레 안은주 이사의 설명을 옮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레 축제 때문에 제주도에 왔다는 응답자가 94%이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되는 국내 축제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올해 처음 참가했다는 제주도민이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제주도민만 몰랐던 제주도 최고의 축제.’ 텀블러 갖고 다니며 일회용품 일절 안 쓰는 올레꾼을 보며 제주도민도 바뀌고 있습니다.”

올레 축제에 참가하려고 일본에서 날아온 올레꾼의 베낭. 제주올레는 물론이고 규슈올레, 미야기올레 등 올레 자매길의 온갖 표식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손민호 기자
제주올레 걷기축제 설문 응답자의 평균 축제 참가횟수는 2.55회다. 한 번 오면 또 온다는 뜻이다. 10년 연속 참가한 중독자도 허다하다. 물론 나도 여기에 들어간다. 올레 현상(Olle Cult)을 앓고 있는.
레저팀장 ploveson@joongang.co.kr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