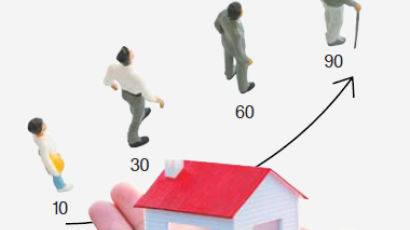![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에 사는 마미 가네코가 방금 태어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아기는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 사용 첫 날인 지난달 1일 태어난 일명 '레이와 베이비'다. [지지=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07/e93cb626-17ea-454e-b185-b832742e659b.jpg)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에 사는 마미 가네코가 방금 태어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아기는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 사용 첫 날인 지난달 1일 태어난 일명 '레이와 베이비'다. [지지=연합뉴스]
“감기약 먹고 일하는 직장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전문가인 쓰쓰이 준야(筒井淳也) 리쓰메이칸대 산업사회학부 교수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남성 중심의 일문화’를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한 말이다. 쓰쓰이 교수는 “유럽에선 감기에 걸리면 회사를 쉬는데, 일본인은 약을 먹고 일한다”며 “이런 직장문화가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 내 소득 증대를) 가로막아 결국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문화교류회의와 주한 일본공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첫 한일사회문화세미나로 양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세미나는 서울의 일본공보문화원에서 지난달 31일 열렸다.
4명 중 1명은 ‘결·못·남’, 출산율 직격타
이날 강연자로 나선 쓰쓰이 교수는 현재 일본 내각부 저출산위원회(제4차 소자화사회 대책·대강을 위한 검토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를 연구해온 그는 한·중·일·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인 저출산 배경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사회와 달리 혼외 출생 비율이 매우 낮아 혼인율 저하가 출산율에 직격타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경우 1970년 이후 출산율 저하 요인 중 90%가 미혼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쓰이 준야 리쓰메이칸대 산업사회학부 교수가 지난달 31일 서울 주한 일본공보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의 미혼율이다. 쓰쓰이 교수는 “일본의 생애미혼율(태어나서 50세까지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4명 중 1명꼴이고, 여성은 7명 중 1명꼴”이라며 “이렇게 남성의 비율이 높은 건 이상한 사회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결·못·남’의 급증 원인과 관련해 ‘미스매치(mismatch) 가설’을 들었다. 여성이 자신보다 소득이나 직업 면에서 우월한 남성과 결혼하려는 ‘상승혼’ 경향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충족할 만한 남성의 절대 숫자가 크게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한 남성 회사원이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건물 앞을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07/e0182234-dfbf-4cf1-acdb-3b52c486ed4c.jpg)
한 남성 회사원이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건물 앞을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쓰쓰이 교수는 “(연구 결과) 일본의 대졸 여성은 연봉 500만 엔(약 5000만원) 이상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 비율이 높지만, 실제 그런 (고소득) 독신남은 20%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이 원하는 소득과 직업을 가진 남성이 출현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이 되면서 (미스매치 현상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日 저출산 50년간 진행, 한국은 너무 급격"
통계로 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먼저 몸살을 겪었던 선배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0.98명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상반기 추세로 볼 때 지난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2005년 최저치인 1.26명을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해 최근 몇 년 사이엔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어린이 유원지 '고도모노쿠니'에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나왔다. 김상진 기자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해 쓰쓰이 교수는 “솔직히 놀랐다”며 “일본의 저출산화는 50년간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한국은 너무 급격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방에서 아이를 키워 도쿄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보다 지방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아 (전체 출산율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에 반해 한국은 (출산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성별 분업으로는 저출산 극복 못 한다"
쓰쓰이 교수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한국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그간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을 핵심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는 근본 문제인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쓰쓰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의 영역인) 결혼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가사·육아를 전담하는) 성별 분업을 유지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는 없다”고 사회문화적 체질 개선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싸울 수 있습니까”라는 문구가 쓰여진 1990년대 일본의 피로회복제 광고를 소개하면서 “이런 남성의 일하는 방식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산쿄는 피로회복제 '리게인' 광고에 "24시간 싸울 수 있습니까"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역설적으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일본 남성 회사원들의 모습을 표현한 셈이다. [다이이치산쿄 홈페이지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07/c73d729b-8c94-45d6-bec5-9a46b084cc3e.jpg)
1990년대 초반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산쿄는 피로회복제 '리게인' 광고에 "24시간 싸울 수 있습니까"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역설적으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일본 남성 회사원들의 모습을 표현한 셈이다. [다이이치산쿄 홈페이지 캡처]
최근 아베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사정도 결국 저출산 해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세대 소득이 늘어야 양육도 가능해진다”며 "혼자서는 어렵지만 맞벌이라면 가능하다는 게 (일본 정부가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맞벌이의 질도 문제다. 그는 “일본은 부부 모두 정규직인 맞벌이 환경이 20% 수준으로 미국·유럽 대비 훨씬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최근 5년간 (정책적으로) 겨우 조금 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런 대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