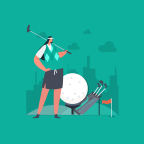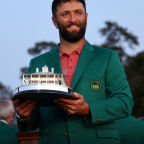폭염 사회
에릭 클라이넨버그 지음, 홍경탁 옮김, 글항아리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다. 2003년 유럽에서는 7만여 명이, 2010년 러시아에서는 5만여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1995년 7월 14~20일 미국 시카고에서도 폭염으로 739명이 사망했다. 이틀 연속 46도가 넘는 고온이 나타난 데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도시 열섬 현상 탓이었다.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폭염에 희생됐는지 궁금했다. 그는 16개월 동안 시카고 현장을 발로 뛰며 조사했고, 희생자 대부분이 빈곤층의 고립된 노인인 것을 밝혀냈다.
상당수 희생자는 창문조차 열 수 없고, 에어컨도 없는 원룸에 살았지만, 범죄가 두려워 외출을 꺼리는 바람에 고독사했다. 반면 시카고 보건 공무원들이나 의사들은 폭염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경찰도 범죄가 아니라며 소극적이었다. 대규모 희생은 폭염 그 자체보다 사회 상황이 빚은 비극이었다.
그해 7월 29일 두 번째 폭염이 왔을 때는 달랐다. 한번 사고를 경험한 시카고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웃도 챙겼다. 시청도 전문간호사 등 300명을 폭염통제센터에 대기시켰고, 방송도 비상경고를 했다. 덕분에 사망자를 2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한국도 1994년 폭염 때 전국에서 3000여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올여름에도 밭일하다가, 선풍기 하나로 버티다 쓰러진 희생자가 40명이 넘는다.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무더위 쉼터 등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들러보는 일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시카고 폭염의 비극이 주는 교훈이다.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월급 끊긴 간호사와 환자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ae147254-79ab-4abf-8f36-504f36f57bc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