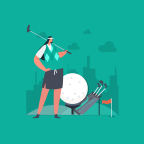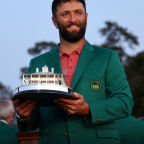1 연암 박지원이 쓴 중국 견문록의 제목 『열하일기』의 열하(熱河)가 쓰여진 돌 표지석. 열하는 청나라 강희제 이후 역대 황제들이 거처했던 피서별장의 소재지로, 근처에 온천이 많아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다는데서 유래했다.

2 연암이 만주족 관리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불편함을 토로한 ‘산해관’의 누각. ‘천하제일관’이란 편액이 붙어있다.

3 중국이 손꼽는 여름 휴양지 ‘북대하’ 풍경. 7000여 종의 조류가 몰려드는 습지와 바다 풍광이 한 폭의 그림을 이룬다.

연암의 손자인 박주수가 그린 박지원 초상. 매서운 눈매와 우람한 몸집이 인상 깊다.
237년 전 이 무렵, 조선 선비 한 사람이 중국 구경에 나섰다. 18세기 실학자이자 사실주의 작가인 연암(燕巖) 박지원(1737~1805)이다. 1780년 5월 25일, 43세 연암은 정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팔촌 형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 건륭 황제의 탄생 70주년을 경축하러 가는 사절단에 동행했다.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넌 연암은 열하와 북경을 거쳐 10월 27일에 한양에 돌아왔다. 다섯 달에 걸쳐 대륙을 주유한 연암은 보고 들은 중국의 면모를 4년 동안 성심껏 집필했는데 그 견문록이 『열하일기』다. 오늘로 치면 유목민의 선구자라 할 연암은 방랑자의 정신이 번득이는 유쾌한 어조로 신문물을 기록하면서도 중국의 치부를 날카롭게 풍자한다. 연암의 정신을 잇고자 일부나마 그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성균관대 ‘심산(心山) 김창숙 연구회’(회장 김정탁) 답사단을 중앙SUNDAY S매거진이 동행했다. (*중국 지명과 인명, 고유명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좇아

연암이 1780년 중국에 다녀온 뒤 4년에 걸쳐 집필해 펴낸 『열하일기』의 표지.
『열하일기』를 배낭에 넣고 비행기에 오른 지 두어 시간, 연암이 말을 타거나 걸어서 한 달에 걸쳐 도달한 중국 땅이 발아래다. 책의 들머리인 ‘도강록(渡江錄)’ 중 일화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백두산 일대 장마로 발길이 묶였다가 불어난 강물을 조심조심 건너게 된 연암은 역관에게 묻는다. “자네 도를 아는가?” “그 무슨 말씀인지요?” “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세. 도는 저 강 시울(가장자리)에 있느니.” 풍찬노숙 와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 연암의 유머 정신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연암은 스스로를 ‘소소(笑笑) 선생’이라 불렀으니, 개그맨의 시조라 불러도 좋으리라.
강을 무사히 건넌 연암 일행은 야영지에서 옷가지와 이불을 말리며 냇가에 나가 술을 마신다. 『열하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먹거리가 술인 것을 보면 연암은 애주가였던 모양이다. 천진 공항에서 짐을 찾은 답사단도 버스를 달려 진황도시(秦皇島市)의 한 식당에서 목을 축인다. 진황도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급 풍경 명승구’로 고운 모래 백사장과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이름난 곳이다.

4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관문 중 하나인 ‘산해관’의 담. 수백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재료로 개축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5 ‘북대하’의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택동 동상과 그가 쓴 시비.
연암의 발길과 목소리 생생한 산해관
시 동북부에는 만리장성의 관문 중 하나로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 불리는 산해관(山海關)이 자리하고 있다. 연암은 군사 요충지인 이 산해관을 통과한 뒤 ‘산해관기(山海關記)’를 남겼는데, 그 한 대목을 보니 며칠 전 왔다간 듯 생생하다.
“산해관은 지세로 보아서도 반드시 차지해야 할 곳이고 성으로 보아도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 첫째 관문은 옹성으로 누각은 없었다. 옹성은 남쪽, 북쪽, 동쪽 세 곳을 뚫어 문을 내고 쇠 문짝을 달았는데 홍예 이마에는 ‘위진화이(威鎭華夷)’라고 새겼고, 둘째 관문은 4층의 망루인데 홍예 이마에는 ‘산해관’이라 새겼고, 셋째 관문은 삼첨 누각으로 되었는데 편액을 세워 ‘천하제일관’이라고 써 붙였다. (…) 중국의 상인과 길손들도 역시 성명, 거주, 소지품들의 이름과 수량을 죄다 등록하여 도적을 조사하고 간첩을 막는 것이 아주 엄중하다.”
연암은 “나는 맨 밑자리의 선비다. 볼 만한 구경거리는 바로 기와 부스러기에 있고 똥거름에 있다고 대답할 것”이라 했으니 그의 열렬한 탐구심과 설득력 있는 묘사는 오늘로 치면 탐사보도에 맞먹는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연암이 아니다. 이어지는 한마디가 흥미진진하다. 만주족 세관과 수비들에게 어지간히 시달렸던 모양이다. 명나라 말,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청나라에 협조하려 산해관 문을 청군(淸軍)에게 열어준 사실을 빗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흥! (…) 이 관을 지어 오랑캐를 막고자 했더니 오삼계가 관문을 열어 적군을 맞아들이기에 여가가 없었구나. 천하가 무사태평한 이때야말로 공연히 장사치 길손 나부랭이나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힐난을 한대서야 난들 이 관에 대하여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산해관을 바라보던 박승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산해관에서 노님(遊山海關)’이란 칠언절구 한 수를 읊었다.
“망망한 발해는 변함없이 맑으며(茫茫渤海古今淸) / 천하제일관은 옛날 정취 품었는데(天下一關懷舊情) / 연경 가는 사신 깃발 보이지 않고(不見燕行使臣旝) / 오가는 여행객의 옷만 화려하구나(往來遊客服裝明).”

6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인 ‘피서산장’의 입구.

7 18세기 후반 ‘피서산장’의 실경도.

8 청나라의 칼칼한 기상이 살아있는 ‘피서산장’은 수백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자연 속에서 국정을 도모했던 중국 황제의 정신을 보여준다.
중국 정치인들의 휴양지 북대하와 피서산장
시의 남쪽에는 중국이 손꼽는 여름 휴양지 북대하(北戴河)가 펼쳐진다. 해마다 7000여 종 새들이 모여드는 조류 최대 습지로 파도가 부서지는 아득한 백사장이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이곳에 중국 최고위 정치인들이 별장을 짓고 몰려든 건 모택동(1893~1976) 국가주석 시절부터다. 등소평(1904~97)도 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겼다고 한다. 여름이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권력 상층부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사(政事)를 논했고, 이를 일러 ‘북대하 회의’라 했다. 1958년 8월부터 매년 여름 피서를 겸해 여는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요 의제를 결정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연례행사가 됐다.
북대하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모택동의 동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서 있었다. 모 주석이 54년 여름, 북대하의 풍경을 노래한 ‘낭도사(浪淘沙)·북대하’가 그의 붓글씨로 바위에 새겨져있다. 북대하를 즐기며 나랏일을 논한 중국 정치인들은 시정(詩情) 넘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유를 찾지 않았을까.
답사단은 다시 연암을 좇아 승덕시(承德市)에 있는 피서산장(避暑山莊)으로 발길을 옮겼다. 청나라 때 지어진 이 여름별장은 중국에서 가장 큰 황실 정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연암 일행이 연경(북경)에 도착했을 때 건륭 황제는 열하(熱河)에 있는 피서산장에 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산장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내린다. 연암의 여행기는 이때 일을 기록하고 있다.
“거처하는 궁전은 그리 화려하지를 않고 이름도 ‘피서산장’이라고 하여 황제는 이곳에서 독서로 소일을 삼고 산수를 흥취로 여겨 세상 밖에서 한낱 평민의 생활에 취미를 두는 듯했지마는 그 실상인즉, 험악한 지세를 이용하여 몽고의 산멱을 틀어쥐고 국경 밖으로 깊숙하게 자리를 잡아 피서에 이름을 붙이고는 숫제 천자 자신이 오랑캐들을 방비하고 있는 셈이다. (…) 이번에 우리 사절은 창졸간에 천자의 부름을 받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닷새 동안에 열하까지 대었으니 가만히 노정을 꼽아 보면 아무래도 400리가 아닌 것만 같았다.”
연암이 보던 그대로인 듯, 피서산장은 나지막한 건물과 거의 손대지 않은 듯 자연스런 정원으로 사람들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치유의 장소였다. 북경의 자금성이 화려한 것에 비하면 이 여름 궁궐은 누옥(陋屋)이라 할만 했다. 대륙을 누비며 제국을 통일한 청 왕조의 자연 친화적 본성과 싱싱한 야성, 칼칼한 기상이 살아있는 곳이랄까. 권좌에 앉아 권력을 지키려 심신을 소진한 황제가 돌아와 마음의 평정을 찾을만한 공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답사단을 이끈 김정탁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새 대통령, 새 각료, 앞으로 새 정부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은 북대하와 피서산장에서 국정의 지혜를 얻은 중국 정치가들을 한번쯤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영휘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는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좋은 것과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대비하면서 그 원인이 무능한 양반 사대부들 때문임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연암은 자신이 벗어나려 애썼던 조선 지식인사회의 틀을 깨기 위한 전략으로 도발적인 글쓰기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답사단은 피서산장에 더 머물고 싶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열하일기』의 나라를 떠났다. 230여 년 전 연암의 형형한 눈빛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기원하며. ●
진황도시(중국 하북성)=글·사진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johanal@joongang.co.kr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월급 끊긴 간호사와 환자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ae147254-79ab-4abf-8f36-504f36f57bc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