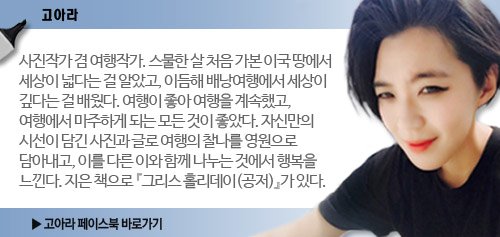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게스트 하우스 직원에게 작별인사를 건넨 후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날씨가 어지간히 추웠나 보다. 자동차 앞유리에 서리가 허옇게 껴있다. 종이로 대충 몇 번 벅벅 문질러 닦아낸 후 출발했다.
아이슬란드의 서쪽 허리, 길쭉하게 뻗어있는 스나이펠스네스 반도. 오늘은 빙하로 뒤덮인 화산 ‘스나이펠스요쿨(Snæfellsjökull)’을 옆에 끼고 반도의 최서단을 둥글게 달려볼 생각이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로를 내달렸다. 양옆으로 뻗은 끝없는 대지의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하늘을 달리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다.

신나게 달리던 중 오른쪽에 조그마한 언덕이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생뚱맞았다. 괜한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삭스홀(Saxhóll)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다. 분화구였다. 그러고 보니 메모장에 적어둔 기억이 어렴풋하게 났다. 일정이 빡빡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만큼 아담했다. 하지만 이래 봬도 3000~4000년 전에 형성된 몸이었다.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몇천 년 된 분화구라니. 아이슬란드다웠다.

옆에는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투박하게 나 있었다. 오르기 시작했다. 경사도 완만하고 높이도 100m 남짓이었지만 숨이 제법 가빠왔다. 몸에 열이 오르고 땀이 맺힐락말락 할 때쯤 정상에 도착했다. 헉헉대며 뒤를 돌아보았다.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했다. 울퉁불퉁한 것이 화성의 표면 같기도 하고 달착륙 영상에서 보던 그것과 비슷하기도 했다. 사방은 우주였고 내가 서 있는 움푹 파인 분화구는 우주의 배꼽이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구름 속 어딘가에서 해의 꿈틀댐이 느껴졌다. 온 대지에 내려앉은 하얀 눈이 빛에 반짝거렸다.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분화구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쪽에 꽂힌 은색 나침반을 바라보며 여기가 우주 어디쯤일까 생각했다. 나침반 위로 비친 하늘과 구름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그곳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 가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곤 했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다. 너도나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겨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에게는 지금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었다.
3-2. 출구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를 돌면 돌수록 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짐을 느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말도 안 되게 펼쳐졌다. 예를 들면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 떼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이끼가 무성한 용암 들판으로 변한다거나, 금방이라도 우주선이 착륙할 것만 같은 미래적인 풍경들이 일순간에 구석기시대에나 볼 법한 원시적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뿌연 안개와 물기를 한껏 머금은 차가운 공기는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죽박죽 깔린 길을 두서없이 달리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574번 국도를 타고 반도의 서남쪽에 있는 듀팔론산뒤르(Djúpalónssandur)로 향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곳에 검은 해변이 있다 하여 찾아갔지만, 있어야 할 바다는 보이지 않고 잡초 무성한 들판만 펼쳐져 있었다. 트레일 코스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여기저기 꽂혀있었다. 조금 걸어야 바다가 나오는 모양이었다.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오래 전 화산에서 흘러내려 온 용암이 이곳에선 뾰족하게 굳고, 여기에선 한 데 뭉쳐 굳고, 저기에선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채 굳어 거대한 기암괴석 숲을 이뤘다. 자연이 거칠게 빚어낸 조각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날 것의 냄새가 가득했다. 태초의 지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검은 자갈이 깔린 해변 위에는 찢긴 난파선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다 이곳에 불시착해 과거에 영원히 갇혀버린 타임머신의 흔적 같았다.

제법 넓은 자갈밭을 지나니 짙은 바다가 펼쳐졌다. 바닷속까지 뻗어 있는 바위는 겨울 바다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얀 포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다 가까이 다가섰다. 파도가 밀려와 검은 자갈을 적시곤 다시 바다로 돌아가길 반복했다. 문득 쥘 베른의 소설 ‘지구 속 여행(Journey to the Center of the Earth)’이 떠올랐다. 그는 스나이펠스네스 화산 분화구를 지구 속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표현했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은 차가운 빙하로 덮여버린 저 화산의 정점이 지구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이곳 듀팔론산뒤르는 지구 밖 다른 세상으로 탈출하는 문이라고.
![[오늘의 운세] 4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