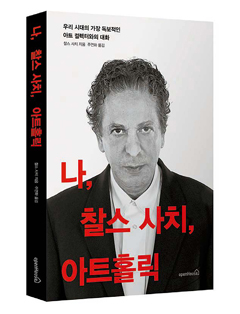 저자: 찰스 사치 역자: 주연화 출판사: 오픈하우스 가격: 1만4000원
저자: 찰스 사치 역자: 주연화 출판사: 오픈하우스 가격: 1만4000원 1997년 런던 로열 아카데미에서 선보인 전시 ‘센세이션’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유리관 속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상어 한 마리를 통째로 박제한다거나(데미언 허스트의 ‘살아 있는 자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 온갖 잡동사니에 파묻힌 침대가 작품으로 등장했다(트레이시 에민의 ‘내가 같이 잤던 모든 사람들’).
『나, 찰스 사치, 아트홀릭』
보통 사람들에겐 이게 무슨 예술이냐고 할 법한 전시를 기획한 사람은 찰스 사치(72). 그는 예전부터 런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여, 그 소장품들을 모아 해외 순회전까지 마련한다. 그리고 이를 정점 삼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트 컬렉터로 자리매김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린다. 무명·신진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싼값에 사서 전시를 열고 그 뒤에 되파는 전략 때문이다. 그가 택한 작가의 작품은 미술시장에서 값이 오르고, 팔려고 내놓은 작품의 작가는 미술시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미술계의 인큐베이터라는 업적과 상업주의에 물든 장사꾼일 뿐이라는 혹평이 맞선다.
여기에 대한 가치판단은 잠시 접어두자. 어찌 됐든 사치로 인해 미술계가 자본의 논리에 편입됐고, 작가들의 작품 경향 역시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다. 대체 그가 어떤 기준으로 미술품을 택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다.
책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서다.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인터뷰로 엮었다. 사치에 관해 일뿐 아니라 개인적 질문도 섞여 있다. 흥미로운 건 묻고 답하는 모든 게 돌직구라는 점이다.
일단 지금껏 인터뷰를 극도로 꺼려온 이유부터 심상치 않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란다. 그가 정의하는 예민함이란 자만심이 강하고 과민하다는 뜻. 실제 그는 무슨 질문에도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하다.
이 대목이 압권이다. “예술을 보는 눈도 없으면서 상품으로 둔갑시키고, ‘발굴’했다는 데미언 허스트니 제니 사빌은 안 그랬어도 알아서 컸을 작가고, 하루 아침에 충격을 주는 작품으로 성공시키는 걸 중시한다는 비난이 있어요”라고 긴 질문을 던졌는데, 반응은 한 문장이다. “알려줘서 고맙군요.” 좋은 점을 알려달라는 호의성 주문에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왜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자신의 취향에 대한 확신도 보통이 아니다. 마크 로스코를 보고 무한성의 압도적 느낌을 받거나 그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바스키아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인정하는 요절 작가로 스콧 버튼을 언급한다. 하여 그의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작품이란 100번 이상 보았던 것과 닮지 않았을 것, 또 시각적으로 즐겁거나 아니라면 특별한(좋은 의미의) 혐오감이라도 있어야 한다.
책 제목은 인터뷰에서 따 왔다. 당신 자신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의 답이다. “내 이름은 찰스 사치, 나는 예술 중독자입니다.” 곱씹을수록 힘이 느껴진다. 이렇게 자신을 간단명료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정말로 변함없이 반해 있는 것은 그 어떤 작가도 작품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답은 그래서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글 이도은 기자 dangdol@joongang.co.kr
![호수에 차 놓고 사라진 건설사 대표…전북 정·재계 뒤집혔다 [사건추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df7d6025-7503-46ff-95c7-aa068e21a72b.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