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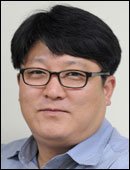 임명수
임명수사회부문 기자
세월호 생존 학생을 많이 대할 기회가 있었던 A씨. 그는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 중에 이 말이 가장 가슴을 찔렀다고 했다. “이력서에 꼭 ‘단원고 졸업’이라고 써야 하나요. 고교 학력 적는 칸을 없앨 수는 없나요.”
이유는 이랬다. “세월호에서 살아났다고 알려지는 게 겁나요. 인터넷에서 우리를 막 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직장에 가도 그럴 것 같은데 불이익당하면 어쩌죠? 왕따당하면 어떡하죠?”
생존 학생들은 이제 고3이다. 1년 뒤면 대학으로든 사회로든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고민이 닥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엇나간 인터넷 공격 글이 이들에게 심어준 또 다른 트라우마였다.
그렇게 자신은 감추고 싶어했지만 학생들은 먼저 별이 된 친구들은 세상이 오래오래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같은 친구인데 기억해주시고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진짜 따뜻해진답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순수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슬픈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마음대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었다. 울면 “바보같이 운다”고, 웃으면 “친구가 희생됐는데 살아났다고 낄낄대느냐”고 수군대는 목소리에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들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물을 냈다. 예컨대 돌아오지 못한 친구가 정말 보고 싶어 “세월호를 인양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가 그랬다. 한쪽에서는 이를 갖고 “즉각 인양하라”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또 다른 쪽에선 “학생들이 특정 정치 진영의 주장에 동조하느냐”고 해대는 게 정말 듣기 싫었다고 했다.
매사가 그런 식이다 보니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학생이 상당수다. 심지어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 이곳저곳이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다고 부모와 교사들이 걱정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진상 규명과 배·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떠들썩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생존 학생들의 아픔을 어떻게 계속 어루만져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듯하다. 어쩌면 어린 학생들이야말로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데도 그렇다.
물론 생존 학생들도 배·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참사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가꿀 힘을 내도록 오랫동안 보살펴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지 바로 논의를 시작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임명수 사회부문 기자
![[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2f771d18-42c5-436f-8494-68e4fd1e2fa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29edbe-743e-4774-b66c-1710aaaf857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